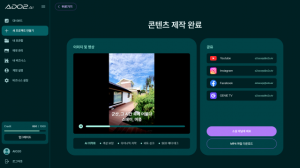<사진. 덴마크의 전원구성 변화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총발전량의 40%를 풍력으로 한 덴마크
덴마크의 풍력발전사업자 단체인 DWIA(Danish Wind Industry Association)는 2015년 1월 12일, 2014년 연간 발전량 중 39.1%를 풍력발전이 차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나의 국가로서는 세계 기록에 해당한다. 2014년 1월에는 월간 발전량의 61.7%를 조달하였다. 2013년 풍력발전 비율은 33.2%였다. 이번에 5.9포인트 기록을 향상시킨 것이다. 2013년에 도입된 대규모 풍력발전소로서 예를 들면 앤 홀트(Anholt) 해상풍력발전소(출력 400MW)가 있다. 이것은 영국 런던 어레이(London Array)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풍력에의 의존도를 어디까지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도 기록을 수립하였다. 2014년 1월에 월간 소비전력의 61.7%를 풍력으로 조달하였다.
덴마크는 원래 종래형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원자력발전도 도입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석유화력을 주체로 한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 후 북해유전의 개발에 의해 석유의 자급률이 100%를 돌파하였다. 그런데 덴마크가 권리를 가진 북해유전은 규모가 작고, 1980년대에는 수입 석탄에 의한 발전으로 전환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자료(1971~2009년)에서 덴마크의 전원구성 변환을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에는 석탄화력의 비율이 95%를 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석유 등 화석연료에의 의존도가 이미 90%를 넘고 있다.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97년 이후이다. 풍력과 바이오매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덴마크를 일본 국내의 지역과 비교하면 홋카이도가 적절하다. 덴마크의 면적은 4.3만km2, 인구 56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약 반 정도의 면적에 거의 동일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형태이다. 덴마크의 연간 발전 전력량은 337억kWh(2011년)이다. 홋카이도 전력은 342억kWh(2013년)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도 풍황이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홋카이도에는 일본 국내 풍력발전의 도입 잠재량 중 49%가 집중되어 있다.
홋카이도는 덴마크와 같이 풍력발전에의 의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덴마크가 유리한 점은 두 가지 있다. 첫째 덴마크에는 국제연계선이 갖추어져 있다. 덴마크는 남쪽으로 독일, 북쪽으로 스카케라크(Skagerrak)해협을 끼고 노르웨이, 동쪽으로 카테갓(Kattegat) 해협을 끼고 스웨덴과 접하고 있다. 독일과는 10만kW, 노르웨이와는 104만kW, 스웨덴과는 130만kW의 연계선이 있다. 홋카이도전력은 다른 계통과 1개소만 연결되어 있다. 홋카이도 혼슈간 연계선(60만kW)이다. 2019년도에는 90만 kW까지 증강시킬 계획이지만, 덴마크 정도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열전병용(코제너레이션)의 대량도입이다. 코펜하겐의 평균기온이 1월에 1.4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난방이 필요하다. 덴마크 정부는 1975년에 코제너레이션의 대량도입을 계획하였다. 발전에서 생성되는 열을 난방에 이용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소비하는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2006년에는 코제너레이션에 의한 발전이 42.6%까지 상승하였다. 효율도 좋다. 최신 코제너레이션 발전소의 종합에너지 효율(전력+열)은 95%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상적인 수치이다. 당초에는 천연가스를 주요 연료로 하였지만, 이후에는 바이오가스 비율이 높아진다. 덴마크는 2030년에 석탄을 전부 폐기하려고 하고 있으며, 풍력과 코제너레이션으로 실현하려고 한다.
코제너레이션이 풍력의 출력변동 제어에도 도움이 된다. 코제너레이션의 도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풍력을 대량 도입하더라도 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홋카이도 전력은 대규모 코제너레이션 대응 발전소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연계선과 코제너레이션 이외에도 계통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있다. 출력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가스터빈 발전 이외에 양수발전, 수력발전 등이다. 모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풍력발전의 대량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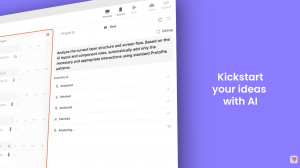


![[인터뷰] (주)마토코리아, 산업용 집진기 기술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시 실현](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m4tzpGdJWZ.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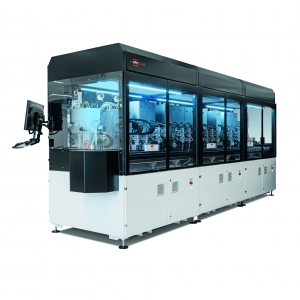
![[스페셜리포트] 시바우라기계, 스마트 기술력 총망라한 ‘솔루션페어 2025’ 성료](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7lXkxWJPCh.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