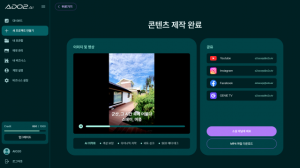<사진. 비주택용시스템(발전소)의 발전비용 목표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저렴한 전원을 대량도입: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
태양광발전의 최종목표는 기존 대규모 발전소를 일부 전환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발전비용의 저감이다.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5년 만에 책정한 새로운 로드맵 “태양광발전개발전략”의 내용을 소개한다.
태양광발전은 만능이 아니지만, 현재 전력시스템의 일부를 전환하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대 특징은 발전용 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발전 시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대책에도 도움이 된다. 대규모화에도 적합하다. 태양전지를 대량생산하더라도 희소자원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전자계산기를 구동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태양전지로부터 수백MW의 규모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소규모와 대규모 모두 발전성능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입지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태양광발전기술에는 큰 단점이 있다.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5년 만에 책정한 로드맵인 “태양광발전개발전략”에서는 4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시스템 설치에서 폐기까지를 고려할 때 발전비용이 일본 국내에서는 아직 화력발전을 대체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우선 (1) 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효율이 10~20%이다. 태양광이 가진 에너지의 절반을 버리고 있다. 다음은 설비이용률이다. 에너지원이 태양이기 때문에 24시간 최대출력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균으로 하면 최대출력의 12% 정도이다. 마지막이 토지이용률이다. 건물의 지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토지비용은 발전비용과 직결된다.
(2) 출력이 변동하기 쉽다는 것이다. 계절 및 시간대에 의한 변동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3) 태양광이 가진 에너지가 적다는 것이다. 면적 1m2의 토지에서 얻어지는 전력은 최대 300W이다. 그리고 지역(입지)에 따라 이것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4)는 제조비용이다. 각종 발전방식을 비교하면 2개의 지표가 있다. 첫째는 제조에서 운용, 폐기, 재활용까지 필요한 총 비용이다. 또 하나는 총에너지이다. 현재 태양전지 중 생산규모로 하여 약 90%를 차지하는 결정실리콘 태양전지는 제조시에 고온으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 제조 시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지 않아 제조비용이 높아진다.
4개의 과제 중 태양에너지의 성질 이외에는 기술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이용하고 있는 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발전비용 상한은 FIT의 매입가격으로 결정된다. 출력 10kW 이상의 전량 매입의 경우 32엔(세금 별도)이다. 그러나 FIT는 태양광발전의 보급과 각종 비용삭감, 기술개선을 위한 “일시적인” 제도이다. 그 후에는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발전소와 비용에 관하여 승부해야 한다. 이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측의 목표이다. 소비하는 측에도 유사한 목표가 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얻은 전력을 자가소비한 경우, 상용전원보다 유리할 필요가 있다.
NEDO는 2004년에 “PV2030”, 2009년에 “PV2030+”와 같은 로드맵을 공개하였다. FIT 운용개시 전의 지표이지만, 발전비용 목표수치와 실현시기를 정해 목표 실현에 필요한 태양전지 변환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신로드맵에서도 발전비용의 목표치 자체는 PV2030+와 동일하다. 차이점은 FIT의 운용이 시작됨으로써 시나리오를 2개로 나눈 것이다. 신로드맵에서는 비주택용과 주택용으로 하고 있다. 생산전문 발전소와 주요 용도가 소비인 주택에서는 요구하는 발전비용이 다르다는 것에 대응하였다.
비주택용(생산측)의 시나리오 중 메가솔라 등 발전비용 목표를 보면, 목표를 2단계로 정하였다. 출발점이 되는 2013년 시점의 발전비용은 23엔/kWh이다. 2020년 목표는 업무용 전력가격인 14엔/kWh, 2030년 목표는 기간전원발전비용인 7엔/kWh이다. 업무용 전력가격은 업무용 빌딩 및 상업시설 등 고압 계약을 맺은 경우의 전력가격이다. 도쿄전력의 경우, 계약전력 500kW 미만의 경우 하계 이외(10월 1일~6월 30일)의 전력량요금은 1kWh당 15.99엔(세금 포함)이다. 500kW 이상도 동일한 금액이다. 기간전원발전비용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의 발전비용을 의미하는 값이다.
2011년 12월에 에너지 환경의회 비용 등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비용 등 검증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2030년 1kWh당 발전비용으로서 다음과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 8.9엔 이상, 석탄화력 10.3~10.6엔, LNG 화력 10.9~12.3엔, 석유화력 23.8~41.9엔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태양광(주택용)을 9.9~20.0엔, 태양광(메가솔라)을 12.1~26.4엔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 있다. 태양전지 모듈의 변환효율과 설비이용률, 운전연수(수명)이다. 설비이용률은 현재의 12% 보다 약간 높은 15%이며, 이것은 2020년, 2030년 모두 변하지 않는다. 주로 기술목표는 변환효율과 운전연수이다.
2020년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에서는 변환효율이 22%로 높다. 운전연수의 목표는 25년이다. 2030년에는 더욱 조건이 엄격해지며, 모듈 변환효율은 25% 이상이 된다. 이것은 현재 대량으로 채용되고 있는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에서는 실현할 수 없다. 운전년수 30년도 엄격하다. 파워컨디셔너의 장수명화는 물론 시스템 전체를 높은 효율로 보수관리하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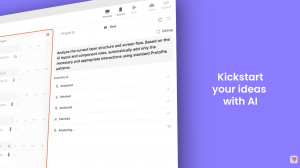
![[인터뷰] (주)마토코리아, 산업용 집진기 기술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시 실현](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m4tzpGdJWZ.jpg)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전문가기고] 페트병 회수기 업체들의 저가 경쟁에 신음하는 페트병 재활용 산업](https://file.yeogie.com/img.news/202406/md/b1aZhEcAwq.png)




![[KOPLAS 2023 Preview] 삼보계량시스템(주), 플라스틱 펠렛 'PLATONⅡ'로 고객 눈길 사로잡다](https://file.yeogie.com/img.news/202302/md/4QINfMIE2G.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