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스위치글래스의 외관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식물을 넘어선 인공광합성-태양전지 기술도 사용
일본 T사는 2014년 12월, 인공광합성의 세계기록을 갱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태양광 에너지 중 1.5%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세계기록을 상회하는 기록이다.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회수하는 기술과 이번 성과를 조합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인공광합성의 선두주자는 2011년 9월에 포름산을 합성한 도요타중앙연구소이다. 2011년 9월에 발표한 시점의 효율은 0.03~0.04%이다. 다음으로 201년 7월에는 파나소닉이 효율을 0.2%까지 높였다. 생성된 것은 포름산이다. 2013년 12월에 효율은 일부분 내려갔지만, 메탄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공개하였다.
T사의 1.5%라는 효율은 식물의 광합성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실제로는 고등식물과 비교한다면 이미 상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증식능력이 높은(광합성 능력이 높은) 바이오에탄올 원료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스위치글래스의 효율은 0.2%이다. T사의 성과는 광합성 능력이 우수한 조류와 거의 동등하다.
인공광합성은 태양광과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하여 연료 및 자원이 되는 식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환원하여 탄소화합물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인공광합성의 목표는 식물 등이 수행하는 광합성이다. 역시 태양광과 이산화탄소, 물로부터 글루코오스(포도당) 등의 탄소화합물(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대기 중의 산소도 거의 대부분이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태양광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태양전지는 유용한 기술이며, 대량 생산품의 효율은 이미 2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액체연료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하다. 인공광합성을 이용하면 태양광과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로부터 연료를 얻을 수 있다.
T사는 화력발전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회수하는 CCS(이산화탄소 분리, 회수, 저장)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CCS는 화력발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유망한 기술이다. 2020년대 전반까지 인공광합성을 실용화하여 CCS와 조합시킬 예정이다. 그것을 위해 효율 10%의 실현이 필요하다.
T사가 개발한 인공광합성용 장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느 부분도 높은 변환효율 달성에 도움이 된다(그림 2 참조). 그림 2의 좌측을 보면 태양광을 받아 물을 분해하여 산소와 수소이온, 전자를 생성한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소이온과 전자만 이동한다. 우측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으로부터 일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있지만, 다양한 화학합성의 원료가 되며,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가스이다. 실험에서는 촉매의 표면에서 일산화탄소의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의 특징은 진한 파란색으로 된 부분과 진한 황색으로 된 부분이다. 우선 진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아모퍼스 실리콘을 이용한 3층의 태양전지와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였다(다접합 반도체). 각각의 층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다르다. 때문에 태양광에 포함된 폭넓은 파장의 빛을 높은 효율로 흡수할 수 있었다. 종래 인공광합성에서는 태양광으로 3% 정도만 포함된 자외선만을 이용하였다. 이번 기술에서는 태양광에 53% 포함되어 있는 가시광을 흡수할 수 있다.
진한 황색으로 된 부분의 특징은 나노미터 크기의 구조를 가진 금 나노촉매를 사용하는 것이다. 금 나노촉매의 제조조건을 검토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로 변화하는 ‘활성 사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효율향상에 도움이 된다. 나노크기의 구조제어기술이라고 한다.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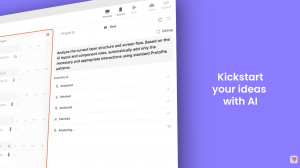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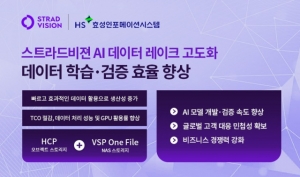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