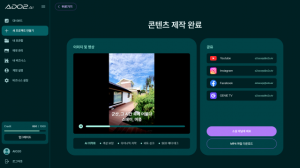Expert View_1
극한작업에서의 인간-로봇 협력 프로젝트
원자력 시설 로봇을 위한 원격조작 시스템의 기술동향(中)
극한작업 로봇 중의 하나인 원자력 시설 로봇을 편하고 실효성 있게 조작하기 위해서 텔레오퍼레이션, 텔레이그지스턴스, 텔레프리전스 등 원격조작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격조작은 극한작업용의 인간-로봇 시스템에서 로봇의 환경적응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안전한 원격지점으로부터 인간 조작자의 거시적인 판단과 조작에 따라 능률적으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원자력 시설 로봇을 위한 원격조작 시스템의 기술동향을 알아보고, 더불어 국내외 원격조작 로봇 시스템의 개발전략 등을 연재를 통해 다뤄보고자 한다.
목 차
1. 원격조작 시스템의 개요
2. 원자력 시설 로봇을 위한 원격조작 로봇 시스템의 기술동향
3. 해외 원격조작 로봇 시스템의 개발전략
4. 국내 원격조작 로봇 시스템의 개발전략
5. 결론
3. 해외 원격조작 로봇 시스템의 개발전략
가. 개발전략의 필요성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비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이 정교하게 수행해야 하므로 시설물의 부정형 장애물을 인지하고 장애물 회피와 통과 기능이 구비된 고기능의 로봇이 요구된다. 따라서 종래의 로봇 공학의 검증된 기술들과 첨단기술(로봇 비전/센싱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네트워크 기술 등), 그리고 인간에 의한 원격제어 등이 융합되도록 하는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원자력 시설 로봇을 비롯한 재난대응 로봇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의 난이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검증된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형의 기술도 발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이 가지는 지각과 인지능력도 최대한 이용되어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온의 극한 환경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의 제어기, 작동기 및 센서를 보호하는 내화기술과 내화 시스템 개발을 통해 극한 환경 하에서의 작업 수행이 가능한 원격조작 로봇 시스템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원자력 시설 로봇을 비롯한 재난대응 로봇 기술은 연구개발 역사가 10년 정도의 신생기술로서 현재는 일부 국가가 기술적 우위를 점할 뿐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선점과 세계수준의 재난대응 로봇 기술 보유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향후 재난대응 로봇 기술을 발전시킴에 따라 자율주행 국방 로봇, 우주 탐사 개척 로봇, 심해 탐사 로봇 및 원자력 시설 로봇의 개발 등 국가전략 분야에 활용도가 크게 제고되어 나갈 것이다.
방사화되어 있는 원자로 내 구조물의 해체는 방사선 피폭방지의 관점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수행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원격조작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작업 기능을 구비한 원격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로봇과 같은 기능을 가진 원격 해체장치 기술을 개발하여 로 내 구조물의 원격해체에 적용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실증하는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 중 미국에서는 Trojan 원자력 발전소, Shippingport 원자력 발전소, ERR(Elk River) 시험용 비등수형 원자로, EBWR(Experimental Boiling Water Reactor) 시험용 비등수형 원자로 등의 로 내 구조물 원격해체에 적용했다. EU에서는 영국의 WAGR(Windscale Advanced Gas Cooled Reactor)로, 프랑스의 GCR(Gas Cooled Reactor) 탄산가스 냉각로, 독일의 WAK(Wied erraufarbei tungsan Karlsruhe) 재처리 시설, 그리고 독일의 KKN(Kern Kraftwerik Niederaichbach) 원자력 발전소 로 내 구조물 원격해체에 적용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원자력 연구소(現 일본원자력 연구개발 기구)를 통해 로봇적 기능을 보유한 원격 해체장치 기술을 개발하여 동력시험로(JPDR; Japan Power Demonstrat
ion Reactor) 해체 실증실험에서 로 내 구조물 원격해체에 적용, 그 유효성을 실증했다. 일본 Tokai 발전소의 폐지조치는 일본의 실용 원자로 폐지조치의 실증으로서 원자로 영역의 해체철거는 2011년도에 시작해 2017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여기에 원격 해체장치의 설치가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나. 미국
미국에서는 2008년 12월 10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평균적으로 약 90%의 높은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 그 중에는 가압수형 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가 69기(출력 7,073.6만㎾e), 비등수형 경수로(BWR; Boiling Water Reactor)가 35기(출력 3,532.5만㎾e)이다. 또한, 1985년 이래 건설을 중단하고 있었던 Watts Bar 2가 2007년 10월부터 건설을 재개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법에서는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인가기간이 40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5년의 원자력법 개정에 의해 운전 인가기간을 60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우량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출력 증강이나 운전 인가 갱신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Trojan 원자력 발전소는 단기(單機) 117.8만㎾e의 가압수형 원자로(PWR)이며, 해체 철거공사의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 철거공사는 1998년 12월에 시작되어 원자로 격납용기 내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를 위해 포클레인으로 매달은 작업용 플랫폼에 원격조작 시스템 탑재의 무한궤도가 부착된 개조중기를 사용하여 해체가 진행되며, 이 중기는 <그림1>과 같다.
미국의 ERR(Elk River)은 Minnesota주 Elk River에 건설된 출력 23.8㎿e의 시험용 비등수형 원자로(EBWR)로서 1962년에 임계가 되어 1968년까지 운전되었다. 미국 원자력위원회(AEC)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해체 철거방식에 의해 1971년에 디커미셔닝(Decommission-
ing)을 개시하고, 1974년에 종료했다. 로 내 구조물의 해체에서는 그에 앞서 플라즈마 절단 토치(Torch)를 조작하는 머니퓰레이터(Manipulator), 원격조작을 위한 컨트롤 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미국 iROBOT사의 PackBot은 1998년에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Tactical Mobile Robotics Program’으로부터 개발을 의뢰받아 2001년 9월 11일의 Ground Zero 수사활동에 처음으로 투입되었다. PackBot의 정식명칭은 ‘iRobot 510 PackBot’으로서 PackBot의 본체는 길이가 68.6㎝, 폭이 52.1㎝, 높이가 17.8㎝이며, 본체 10.89㎏+컨트롤 유닛 12.39㎏로 총중량은 23.28㎏이다. <그림2>는 iROBOT 510 PackBot의 모습이다.
PackBot은 자주속도가 9.3㎞/h로 Microsoft사의 Xbox 360이나 Sonny Play Station의 컨트롤러를 이용한 원격조작이 가능하며, GPS와 컴퍼스를 탑재하고 약 800m 떨어진 장소에서의 원격조작이 가능하다. PackBot은 카메라나 로봇 암 등의 다채로운 옵션을 가진 다목적 작업 로봇이므로 작전마다 장비의 차이에 따라 총중량도 다소 변하며, PackBot의 가격은 1대당 약 12만 달러이다.
PackBot의 조작은 게임 컨트롤러 혹은 전용 컨트롤 유닛(OCU)으로 간단히 수행한다. 이 OCU는 4가지의 화면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카메라 영상×2(풀 스크린 화면×1 영상), 3D 애니메이션에 의한 로봇의 자세나 각종 센서 정보 등이 표시된다. 또한, 스위치에 의해 드라이브 모드(Drive Mode)와 머니퓰레이터 모드(Manipulator Mode)로 바꾸거나 PackBot의 동작패턴을 버튼에 프리세트(Free Set)하여 움직인다.
2011년 4월 17일에 PackBot이 일본 Fukushima 제1원자력 발전소 3호기 및 1호기의 원자로 건물 내에 처음으로 투입되었다. 여기서 건물 내의 모습이나 방사선량, 온도, 습도, 산소 농도 등을 특정했으며, <그림3>은 원자로 건물 내에 들어간 PackBot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원자로 건물에 이어지는 내부 문을 PackBot의 팔로 핸들을 돌려 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수한 조작자라도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다. EU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는 2010년 8월 시점에서 약 430기가 운전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24기의 원자로가 정지되었다. 그 내역을 보면 미국이 29기, 영국이 26기, 독일이 19기, 프랑스가 11기, 일본이 5기, 불가리아가 4기, 이탈리아가 4기, 러시아가 4기, 캐나다가 3기, 슬로바키아가 3기, 그리고 스웨덴이 2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EU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WAGR(Windscale Advanced Gas-cooled Reactor)은 영국 원자력공사(UKAEA)의 Windscale 원자력 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다. 총 출력은 36㎿e의 개량 가스 냉각(AGR형) 원형로로서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운전되었다. 이 원자로는 해체기술 개발을 포함한 해체 철거가 추진되고 있다.
WAGR의 해체작업을 위한 원격 해체장치는 해체된 폐기물을 원격조작으로 신설 폐기물 처리 건물로 반송되어 차폐용기에 수납되고 폐기물 보관건물에 보관된다. 로심부 등의 원격 해체장치는 회전식 상(床) 차폐, 마스르, 머니퓰레이터, 시각조작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머니퓰레이터는 팔의 최대 도달길이가 2.5m, 7 자유도의 관절을 가지고 있으며, 수동 및 자동으로 중량 3㎏의 것을 조작할 수가 있다. <그림4>는 WAGR에 이용되는 머니퓰레이터형 해체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초기단계로 흑연감속 탄산 가스 냉각로(GCR; Gas Cooled Reactor)가 개발되어 상업용 원자로로서 도입되어 왔으나 그 후 전면적으로 PWR형 경수로로 바꾸었다. 2008년 말 현재 평균 가동률 약 75% 이상의 PWR형 원자로 59기의 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3/4 이상을 점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정지된 원자로 수(GCR 8기, PWR 1기, HWGCR 1기 및 고속 중식로 1기 등)는 합계 11기이다.
프랑스의 플루토늄(Plutonium) 생산 겸 원자로인 G2 및 G3로는 각각 흑연감속 가스 냉각형 원자로로서 출력은 43㎿e(260MWt)이며, 프랑스 원자력청이 소유하고 있다. 운전된 기간은 1958년부터 1984년 사이이고, 그 후 1982년부터 폐지조치 작업을 개시하여 1994년에 단계 2(차폐 격이)에 달했으며, 원자로는 횡형(橫型)이다. 이 원자로의 내경은 14m, 길이가 18m의 프레스토리스 콘크리트(Prestoless Concrete)제의 원자로 용기를 가지며, 로심은 2,500톤의 흑연 블럭(Block)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2008년 말 현재 17기(PWR이 11기, BWR이 6기), 출력이 2,137.1만㎾e인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고 있으며, 평균 설비가동률은 80% 후반을 달성하고, 총 발전 전력량의 1/3을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발전용 원자로의 폐쇄는 파일럿 플랜트 7기, BWR형 3기, 구 소련형 PWR형(VVER형) 6기 및 PWR형 3기 등 합계 19기에 달하고 있다.
라. 일본
2012년 7월 일본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수는 51기이며, 폐기 해체 중인 원자로 중에는 냉각형 원자로(GCR) 1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Tokyo 전력 Fukushima 비등수형 경수로(BWR) 4기(1~4호기)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Tokai 발전소의 흑연감속형 탄산 가스 냉각로(GCR)는 2001년 12월에 폐지 조치에 착수했다. 원자로 영역에서는 약 10년간 안전하게 저장한 후에 제 3기 공사로 해체되었다. 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마스트 암(Mast Arm)식 해체장치를 개발하여 사전에 <그림5> a와 같이 실규모에 의한 확증시험을 실시했다.
GCR 냉각로의 원격 해체장치는 직경이 18m인 공 모양으로 된 원자로 용기의 해체 및 용기 내의 흑연 블록을 꺼내는 것이며, 암, 마스트, 잡는 기기, 제어 시스템 및 감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의 구성과 동작원리는 <그림5>의 b~d와 같이 암은 굴절 2, 끝단부 선회 1, 전체의 승강, 선회 각 1이고 자유도 6으로 되어 있다. 암의 조작은 제어, 감시 시스템에 의해 마스트를 선회하여 방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암의 굴절과 승강의 연속동작을 통해 원자로 내부 전 구역의 목표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일본이 2010년에 개발한 최첨단 재난구조 로봇 퀸스(Quince)는 Chiba 대학의 미래 로봇 기술연구센터(fuRo)가 중심이 되어 Fukushima 대응 프로젝트팀이 본체를 대폭적으로 개수하여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대응판으로서 완성시켰다. 이 Quince는 미국 Texas주 Disater시에서 열린 대회에서 사방 40m의 콘크리트 건물 더미와 목재건물 파편이 깔린 실험장을 세계 각국의 참가 로봇 중에서 유일하게 통과하여 세계 최고의 운동성능을 입증했다.
이처럼 뛰어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정작 Fukushima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에 Quince 로봇을 신속히 투입하기 못한 것은 일본 정부가 사고발생 초기 수습작업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현장의 주요 판단을 대부분 Tokyo 전력에 의존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Tokyo 전력측은 로봇의 원전 현장에서의 실전경험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로봇의 중량으로 원전 내에 깔린 케이블의 손상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한 일본 정부와 Tokyo 전력은 미국 로봇 업체들의 로봇 제공 제의만 재빨리 수용하여 미국 iRobot사의 PackBot과 Honeywell사의 T-Hawk 등의 무인 로봇 투입이 조기에 결정되었다. 일본은 로봇만 뛰어날 뿐 이를 상업화할 법과 제도는 한참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미국은 로봇 기술을 재빨리 상업화하여 성공한 벤처 회사들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대학과 기업 연구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Fukushima 제1원자력 발전소(1층) 사고 발생 후에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JAEA)는 1층 사고의 추이를 감안하면서 JAEA가 보유하고 있는 원격조작 로봇 등을 사고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정의 개조 및 정비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γ선을 가시화하고 계측할 수 있는 γ-eye를 탑재한 JAEA-3호의 개조 및 정비가 끝났으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2011년 12월 현재 JAEA 시리즈 중에서 JAEA-3호만이 Fukushima 제1원자력 발전소에 투입되었다. 나머지 JAEA-1호와 JAEA-2호는 JAEA에서 대기 중이다. Tokyo 전력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에 들어간 JAEA-3호가 같은 영역 내를 촬영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또한, JAEA에서는 로봇 외에도 로봇 본체를 원격제어하기 위한 트럭 ‘로봇 컨트롤 차’를 2대 정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이들도 Fukushima 제1원자력 발전소에 투입되었다.
<그림6>에 나타낸 바와 같이 JAEA-2호는 원자력 재해 시의 정보수집 로봇 ‘RESQ-A’를 기반으로 개조한 것으로서 원자로 건물 내에서의 관찰이나 제염작업을 시행하는 로봇이다. 이 로봇의 주된 개량점은 로봇 앞부분에 제염용의 물 살포기가 브러시 등의 청소기기를 장착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이 외에 페이로드(Payload)로서 내방사선 카메라 조명, 방사선 계측기(GM관) 등의 기기를 탑재하고 있으나 로봇 본체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필자약력
이순요 전문연구위원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공학사
미국 시카고대학 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일본 히로시마대학 대학원 공학박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
대한인간공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명예교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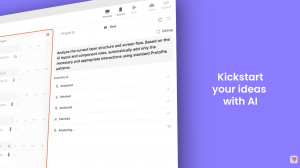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KOPLAS 2023 Preview] 삼보계량시스템(주), 플라스틱 펠렛 'PLATONⅡ'로 고객 눈길 사로잡다](https://file.yeogie.com/img.news/202302/md/4QINfMIE2G.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