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박사의 ‘現問賢答’
현장의 문제 현장 ‘高手’가 해결한다
전기관련 전문 카페 ‘전기박사(http://cafe.naver.com/power119.cafe)’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기관련 국내 최대 커뮤니티다. 현재 회원수만 17만2,600여명. 전문 카페로는 엄청난 규모다. 회원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유용한 정보가 많다는 얘기다. 질문들은 현실적이고 답변은 명쾌하다. 월간 「전기산업」은 전기박사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다.

Q.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송전계통 접지방식이 유리한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우리나라 송전계통에서는 직접 접지방식의 일종인 유효접지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접지방식을 쓰되 모든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통의 영상 임피던스를 고려해 전체 변압기의 중성점 중에서 일부를 직접 접지하는 방식입니다. 중성점 모두를 접지하지 않는 이유는 1선 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평상시 대지 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도록 중성점 임피던스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접지방식의 장점은 1선 지락사고 시 고장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호계전기 동작이 유리합니다. 또한 관련 전기설비의 절연등급을 상전압으로 낮출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변압기의 단절연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 지락전류에 의한 통신선 유도장해, 차단기의 빈번한 동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보통 개폐기는 무부하회로를 접속하거나 분리하는 것이고 차단기는 부하 또는 고장, 단락 사고시의 대전류를 분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스위치는 무엇인가요. 개폐기와 스위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A. 개폐기와 스위치는 같은 말입니다. 즉, 둘 다 전기회로의 개폐를 위한 기기입니다. 반면 차단기는 이상상태(단락상태)에서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만, 옥내전선로에서는 전지 작용 및 바이메탈의 굴곡작용을 응용한 과전류 보호장치로서, 전선 및 기계기구의 보호에 사용되고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Q. 전기설비가 없는 기계, 가령 재질이 Steel 또는 일반 물탱크나 열교환기와 같은 기계설비에도 외함 접지를 해야 하나요.
A.기본적으로 접지를 하는 목적은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이나 화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굳이 접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인 규정도 없구요. 단,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탱크라든지 정전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설비의 경우는 당연히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 운반차량의 뒷면을 자세히 보면 탱크에서 바닥 지면까지 길게 늘여놓은 접지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탱크 안에서 기름이 출렁 일때 생기는 정전기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Q. 전기실이 침수됐습니다. 물이 패널 안에 들어갔다면 지락이든지 단락이든 간에 차단기가 동작하겠지만 그래도 물이 차 있는 곳은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혹시 침수로 인해 전기가 물에 흐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일단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행동하세요. 누전차단기만 있는게 아니라 대부분 배선용 차단기가 1차에 있음을 염두에 두시구요. 순간 잘못 판단해 물속에 발이라도 담근다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침수지역에 해당하는 윗단 전원부터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전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모른다면 전체 전원을 차단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한전에 의뢰해 인입점을 차단시켜 달라고 해야 합니다.
Q. 다양한 종류의 절연장갑을 보면서 정말 이걸 끼면 몇 kV를 잡아도 감전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440V기준으로 RST상 메인 전원에 차단기를 안 내린 상태에서 절연장갑을 끼고 한 선만 작업을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A.저압의 경우 절연장갑은 600V부터 40kV까지(500V, 600V, 1,000V, 10kV, 20kV, 30kV, 40kV) 전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저압의 경우 600V, 특고압은 30kW용 절연장갑을 사용합니다. 허나 2010년부터 국내기준이 IEC기준으로 변경돼 저압에서 사용하는 장갑이 1,000V로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선만 작업할 경우 그 선이 접치 측이면 감전이 안되지만 만약 전원 측이라면 당연히 감전되겠지요. 절연장갑을 꼈다고 해서 일부러 활선부를 잡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갑부분이 절연이 된 것은 맞지만, 장갑 바로 윗觀隙막?통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2.9kV급의 특고압은 활선부에 닿지 않더라도 공기 절연파괴로 통전될 수도 있습니다.
Q.변압기 절연유가 열화, 산화되면 변압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데 폭발하기 전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징후라든지 예방법 같은 것이 있는지요.
A.과부하 운전 시 온도상승에 의해 열화나 산화가 빨리 진행되면 절연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절연내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일반 산업용으로 쓰이는 유입변압기는 대부분 보호장치가 설치돼 폭발하기 전에 전원이 차단됩니다. 폭발이 되려면 압력이 올라야 하며 서서히 오르는 압력은 호흡기를 통해 배출됩니다. 내부에서 단락 등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가스가 발생하고 이때는 방압장치가 미리 검출차단기를 동작시킵니다. 문제는 변압기 내부에서 단자 접촉불량, 절연물질의 탄화, 절연내력의 저하입니다. 변압袖?가스 분석을 년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수변전실에 2대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두변압기 모두 용량이 750kVA(몰드형)이고 부하도 200kW 정도로 같게 걸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내부온도가 각각 50도, 60도로 다르게 나오는데 원인이 무엇인지요.
A.실제 변압기의 부하는 전력 kW가 아니라 kVA로 봐야 합니다. 같은 200kW라고 해도 역률이 나쁘면 피상전력이 커지고 변압기에 걸리는 전류도 커집니다. 실제 부하전류를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200kW에 역률이 1인 변압기와 0.8인 변압기의 전류를 비교하면 0.8인 변압기의 전류는 1인 변압기보다 1.25배, 동손의 손실은 전류가 1.25배, 증가 열은 자승에 비래하므로 1.5625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변압기를 사용하려면 역률이 1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전에서도 역률을 높게 사용토록 권장해 역률이 0.9 이상이면 전력비를 보상하고 0.9 이하면 전력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제 역률도 같고 전류도 같다면 그리고 같은 온도계를 측정했다면 남은 것은 변압기의 차이라고 봅니다.
Q. sec로 하면 편할텐데 굳이 사이클(Cycle)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차단기가 차단을 할 때 실제 접점은 떨어지더라도 아크는 일정시간 지속되다가 전류영점이 되는 점에서 완전히 소호되게 됩니다. 흔히 3사이클 차단기란 사고전류가 bct를 통해 보호계전기에서 검출되고 차단기 트립 신호 발생후 아크를 보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사이클 이내인 차단기를 뜻합니다. 주파수는 해외의 경우 50Hz도 있기 때문에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기회, 즉 전류영점의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규정상에서는 사이클로 차단기의 차단시간을 자주 언급하죠. 물론 국내에서는 주파수가 60Hz로 고정이기 때문에 사이클 보다는 몇 ms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병원 전기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전시 조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UPS는 정전되었을 때 어떻게 동작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한전 정전인 경우는 2회선 수전이라면 ALTS(자동절환 스위치)가 있고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에서 수전을 하게 되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확인사항은 ALTS가 절환되지 않았다면 수동으로 절환시켜야 하겠지요. 1회선 수전이라면 정전 후 15~30초 후 발전기가 운전되어 일부 주요장비(엘리베이터, 산소공급기, 비상등, 급수펌프, 배수펌프, 소화펌프 등)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때 확인사항은 발전기가 운전되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시동을 걸어야 하겠구요, 발전기가 운전은 되지만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압과 주파수 등을 확인한 후 발전기반 ACB(기중차단기)를 수동으로 투입시켜야 합니다.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발전기 부하측에 연결되어 있어 발전기가 운전되는 동안 뿐만 아니라 발전기가 정지되어도 배터리 용량에 따라 일정시간동안 정전이 되지 않도록 전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주요 컴퓨터와 생명과 관계되는 의료기기 전원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확인사항은 평소 UPS의 내부 기판의 그을음, 콘덴서의 과열 등을 점검하고, 부하쪽으로 일정전압을 공급하는지, 또한 용량보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지 기록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UPS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퓐?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UPS가 고장이 날 경우엔 순간적으로 BYPASS(한전전원 공급)되므로 UPS의 고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소음, 과열, 냄새, 전압이나 전류의 변동 등에 관심을 갖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내정전인 경우는 어떤 계전기가 동작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PF(파워퓨즈)나, VCB(진공차단기), ACB(기중차단기) 등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하여 범위를 찾아야 합니다. 확인사항은 PF(파워퓨즈)는 동일 용량으로 최소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전류 또는 PT, CT 등의 고장은 물론이고 차단기류, GiPAM(LS산전)과 같은 기기에서도 고장이 발생하면 정전될 수 있으므로 평소 도면과 전기설비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일반 GPT는 1차 Y결선에 2차 오픈델타로 되어 있는데요. 1차를 델타로 결선하면 안되나요? SGR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압계만 사용할 거라서요.
A.GPT에서 1차를 Y로 하는것 이유가 있습니다. 델타로 하면 그대로 비접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락시 지락을 검출 할수가 없습니다. 즉 GPT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OPEN 델타에 전압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GPT는 중성점을 접지하여 지락시 중성점의 전위를 지락된 선전위로 만들어 2차 오픈델타에 전압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Q. 냉·온풍기 겸용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단상 11키로 50a 용량입니다. 선로 길이는 70m 정도 되고요. 100a 차단기 스페어가 있어 여기에 물려 설치 하려고 하는데 케이블 굵기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A.전압강하 및 전선의 단면적 계산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L=70M, I=11,000w×220V=50A, e=220V×4%=8.8V이고, A=35.6×70M×50A/(1.000×8.8)V=124.600/8.800=14.15sq=16sq입니다. 따라서 IEC 16sq의 HIV/1c/2매입관시의 허용전류=61A이고, IEC 16sq의 CV/2c/1 상기준배간시의 허용전류=76A입니다. 결국,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전등 및 전력장치 등을 병용하는 간선의 굵기는 단상 11,000w/220v=50A×1.25=62.5A의 전류가 흐르며, 이때 IEC 규격의 62.5A를 허용한 전선의 규격은 25sq 의 HIV 1C× 2 매입배관 허용전류=80A와 16sq의 CV/2c/1 상기준 배관시 허용전류=76A가 됩니다.
Q. 스틸 배관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밴다는 공식이 있다고 하던군요 이곳저곳을 뒤져 한개가 나와 있더군요. 예제가 있는데 36mm 노말(90도) 기준 36×6×2×3.14/4=339.12 그래서 340mm라고 하더군요. 36은파이프규격이 6은 입선을 원활이 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고 합니다. 2는 36×6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3.14는 원둘레이고 나누기 4는 90도 각도이기에 기반 해보려구 했는데 않되더군요. 한쪽은 80cm이고 반대쪽은 1M입니다. 이런 노말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 방식과 다른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금속관을 휘는데 필요한 길이 L=2πr/4=πr/2 (mm)입니다. 여기서 r은 곡률반경으로서 r=6d D/2 로 계산되며, D는 전선관의 두께 포함한 완성외경, d는 전선관의 순수 내경을 말합니다. 예로 36mm 금속전선관의 외경은 41.9mm, 두께는 2.5mm이므로 계산해보면 필요길이 L은 372.0115(mm)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길이 1,800mm 중 ①800과 1,000mm지점에 일단 표시하고, ②표시지점을 중심으로 계산된 필요길이 372.0115를 2등분한 186.00575mm을 좌우에 표시하여, ③표시된 지점부터 마지막 표시지점까지 균일한 힘으로 휘면 됩니다.
Q. pri 154kV/sec 66kV의 TR에서 접지개폐기를 Open 시켜 놓아야 하는지? Close시켜 놓아야 하는지? 양단접지시 한전쪽에서 사고발생시 수용가쪽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수용가쪽에서는 접지개폐기를 Open시켜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현장실사를 해보니 4곳 중에 한곳만 Open되어 있고, 나머지는 Close 상태입니다. 접지개폐기의 Open/Close 위치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TR 붓싱 => 피뢰기 => 접지개폐기 순서입니다.)
A.수용가에서는 기본적으로 T/R 1차측을 직접 접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접지시는 1차측 선로에 사고 발생시 또는 낙뢰 등으로 이상전압이 유도시에 직접 지락 회로를 구성 수전단의 OCGR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TR 붓싱 => 피뢰기 => 접지개폐기 순서라 하였는데 피뢰기와 단로기가 병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DS는 OPEN 시키고 피뢰기를 통하여 방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피뢰기의 주 목적은 변압기에 낙뢰 등 이상전압이 유기되는 것을 억제하여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저희 공장도 처음 설치당시에 직접접지를 하여 여름철 낙뢰시에 상기와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변압기 중성점을 피뢰접지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 전기박사 http://cafe.naver.com/power119.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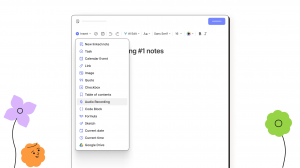








![[스페셜리포트] 시바우라기계, 스마트 기술력 총망라한 ‘솔루션페어 2025’ 성료](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7lXkxWJPCh.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


![[인터뷰] (주)마토코리아, 산업용 집진기 기술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시 실현](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m4tzpGdJWZ.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