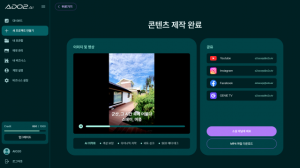<사진. CTBT 희가스 관측소의 분포를 세계 지도상에 나타낸 것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희가스 관측소로는 동아시아 연안국 중 최초로 인증
독립행정법인 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다카사키(高崎) 양자응용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사성 핵종 감시관측소에서 2014년 12월 19일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관 준비위원회(CTBTO)로부터 희가스 관측소로서 동아시아 연안국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얻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영향 등에 의해 인증작업이 연기되었지만, 이번에 핵실험 감시를 위한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국제감시제도의 시설로서 CTBTO에 의한 평가를 얻어 인증된 것이다. 일본의 감시 관측시설의 인증은 본 인증을 통해 모두 완료되어 일본 국내 감시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다카사키 관측소는 입자상 방사성 핵종에 관한 관측소로서 2004년에 이미 인증을 얻었다.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CTBT)은 우주공간, 대기권 내, 수중, 지하를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핵병기의 실험적 폭발 및 기타 핵폭발을 금지하고, 가맹국이 그 준수를 검증하는 체제의 확립 등을 규정한 것으로 1996년 9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14년 12월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3개국이 비준하였지만, CTBT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원자로를 가진 잠재적인 핵개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특정 44개국(발효요건국) 모두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 이 44개국 중 36개국만 비준하였기 때문에 미발효되었지만, 조약에 정한 국제감시제도의 80% 이상의 감시시설이 이미 운용 중으로 실질적인 국제감시체제가 확립되었다.
희가스 감시에 관해서는 그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감시기술보다 늦게 개발이 시작되어 다카사키 관측소에서는 2007년부터 시험적으로 관측을 개시하여 그 운용경험을 통해 희가스 관측장치 등의 개량/갱신을 실시하여 배경농도 자료 취득을 수행함으로써 신뢰성이 높은 국제검증체제의 확립에 공헌하고 있다.
다카사키 관측소의 인증은 세계에서 22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2013년 6월 울란바토르 관측소(몽골)에 이어 2번째 인증이다. 다카사키 관측소의 중요성 때문에 원래 보다 빠르게 인증될 예정이었으나,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 및 지속적인 북한의 지하 핵실험 감시의 필요성 때문에 장치 갱신에 따른 관측 정지 제한 등의 이유로 인증작업이 연기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감시 관측 시설의 인증은 다카사키의 희가스 관측소 이외는 지진 및 미기압 진동 관측소도 포함하여 모두 인증되었기 때문에 이번 인증에 의해 일본 국내 감시 체제는 확립되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실시하였다고 발표한 핵실험(DPRK-3)에 관해 약 2개월 후인 4월 상순에 다카사키 관측소에서 통상적인 농도 변동범위를 넘는 방사성 제논 동위원소(133Xe, 131mXe)가 동시에 검출되었다. 이러한 검출은 2008년 관측 이래 거의 없었으며, 원자력기구에서는 일본 국내 데이터센터(NDC)에서 이 데이터를 상세하게 해석하고 그 동위원소로부터 핵분열의 발생일을 추정하고, 대기운송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출원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해석 결과 등으로부터 이것이 2월 핵실험에서 유래하여 핵실험에 의해 생성되어 지하에 존재했던 방사성 제논이 4월 상순에 방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합적인 기술적 평가에 도달하였다.
CTBT 방사성 핵종 감시 네트워크 설계에서는 “1kt 상당의 핵폭발을 거의 14일 이내에 90% 이상의 확률로 탐지한다”는 기준에 기초하여 핵실험 후 10일 전후에 가장 방사능이 큰 핵종이 되는 입자상 발륨-140(140Ba) 및 희가스 제논-133(133Xe)을 방출핵종(방출량은 각각 2 X 10^15, 1 X 10^15Bq)의 대기 중, 수중, 지하에서의 핵폭발에서 전 지구규모의 대기운송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관측소의 수, 장소, 관측방법과 그 감도 등 기술요건이 상세하게 정해졌다.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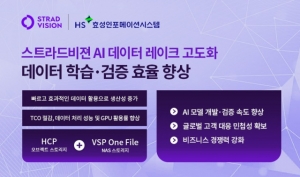

![[인터뷰] (주)마토코리아, 산업용 집진기 기술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시 실현](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m4tzpGdJWZ.jpg)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전문가기고] 페트병 회수기 업체들의 저가 경쟁에 신음하는 페트병 재활용 산업](https://file.yeogie.com/img.news/202406/md/b1aZhEcAwq.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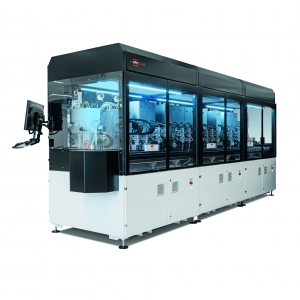

![[스페셜리포트] 시바우라기계, 스마트 기술력 총망라한 ‘솔루션페어 2025’ 성료](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7lXkxWJPCh.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