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개요
2. 풍력터빈 블레이드
3. Self-healing 기술
4. 차세대 풍력터빈 블레이드
5. 자기치유 기술 확대적용
6. 맺음말
---------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약 5%에서 2020년 18%, 2040년 64%로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풍력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풍력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개발과 관련한 꾸준한 연구와 지속적인 투자로 관련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 풍력에너지 협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육상 및 해상풍력 발전용량은 유럽 전체 전력 수요의 10~15%를 차지하는 약 180GW가 될 것이다. 또한 세계 풍력에너지 위원회는 2020년에 풍력 발전용량이 세계 발전용량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풍력발전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키고 고장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Self-healing 기술을 소개하고 적용 가능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요
유럽의 CONMOW report에 따르면 대형 풍력터빈의 유지 보수를 위한 소요 비용은 에너지 생산 비용의 23∼30%에 달하며, 연간 kW당 30∼50유로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500MW 단지 기준으로 볼때,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230∼385억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대형 풍력터빈의 발전기, 기어박스, 블레이드가 다른 부품들보다 고장 빈도 및 고장일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에서처럼 블레이드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형 풍력터빈 사업 및 운영에서 블레이드와 관련한 고장일수 감소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

2. 풍력터빈 블레이드
풍력터빈 블레이드는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키는 공기역학적 구조물이므로 단면 외형은 공기역학적 에어포일 형상의 shell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구조는 높은 굽힘 하중과 전단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box beam 형상을 기본으로 하며, 최소의 재료로 최대의 강도 및 강성을 갖도록 섬유배열 적층구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한다.
최근 블레이드가 대형화됨에 따라 블레이드 재료의 비강성 및 비중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대형 풍력터빈용 블레이드는 대부분 비강도와 비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리섬유복합재료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재료인 수지는 주로 폴리에스터, 비닐에스터, 에폭시 등이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수축이 적고, 피로특성이 우수한 에폭시가 많이 사용된다. 블레이드 스킨의 shell 구조는 압축 하중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통 스킨 사이에 코어를 갖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를 갖는데 코어 소재로는 발사우드, PVC 폼 등이 주로 사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풍력터빈 블레이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이방성 적층구조를 가지며, 일반 금속재료에 비해 경량/고강도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내화학/내환경성이 열악하여 염분이나 햇빛 등에 장시간 노출되면 초기의 물성이 계속적으로 열화되며 피로강도가 낮아져서 악천후 시 비정상 난류에 의해 쉽게 손상 및 파괴될 수 있다.
풍력터빈 블레이드는 파손시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블레이드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적지 않다. [그림 6]은 블레이드의 전형적인 손상 위치 및 종류로 주로 블레이드 앞단과 뒷단에서 접합부의 박리 및 미소 균열에 의한 손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풍력터빈의 안정적인 운전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선진 풍력업체를 중심으로 탄소섬유복합재료 등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탄소섬유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비용 문제와 유리섬유와 함께 사용될 때 발생하는 변형율 불일치와 같은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상기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풍력터빈 블레이드 소재가 고분자 복합재료라는 점에 착안한 Self-healing(자기치유) 기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Self-healing 기술
Self-healing 기술은 낡거나 충격에 의해서 작은 균열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그림 7]과 같이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혈소판이 생성되어 혈액이 응고하는 신체의 자기 치유 방법을 전자회로, 항공기 부품, 의학용 부품 및 콘크리트 건물에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복합재 및 폴리머 소재에 대한 자기치유 기술은 최근 5년 사이에 기술연구 및 개발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기술이지만, 풍력터빈 블레이드 및 에너지/전력설비에 적용하려는 시도나 관련 시장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복합재 자기치유 관련 대표 연구기관 풍력터빈 블레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selfhealing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풍력터빈의 주 소재가 복합재 또는 폴리머 계열임을 염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합재 또는 폴리머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치유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일리노이 대학교 (Scott R. White)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는 2001년 캡슐화된 단량체를 이용한 자가복원성 고분자를 네이쳐지에 처음 발표하였다 [Nature, 2001, V.409, No.6822, 794-796].
[그림 8]에서와 같이 단량체(healing agent)를 마이크로 캡슐에 넣어둔 채로 에폭시 수지를 형성하고 촉매와 함께 고분자 재료를 만든다. 상처가 생기는 순간 발생하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캡슐이 깨지면 액체 상태의 단량체가 모세관 효과에 의해 상처 부위로 스며 나오고, 촉매를 만나 고체 고분자로 중합이 되어 상처가 메워지는 원리를 이용한다.
한편 자기치유가 가능하면서 한번 치유된 상처 부위에 대해서도 재치유가 가능하도록 White 그룹에서는 마이크로 혈관 구조를 도입,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 시스템은 치유 매개체가 균열 속으로 들어가도록 외부에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으며, 물이 빨대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좁은 마이크로 채널을 통해 움직이는 특징을 가진다.


(2) 아이오아 주립대학교 (Michael Kessler)
아이오아 주립대학교에서는 퇴화되어 갈라지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바이오 재생 고분자를 연구하고 있다. 복합재료가 갈라지면 마이크로 캡슐이 붕괴되고 치유제가 흘러나와 촉매와 접촉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3차원의 고분자 사슬을 형성한다. 이러한 고분자 사슬은 고분자의 갈라진 틈을 메우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재료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유지비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3) 일리노이 대학교 (Beckman Institute)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는 전기방사 동축 치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복구 폴리머 코팅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전기방사 폴리머 나노섬유는 섬유를 따라서 임의적으로 분산된 비드(bead) 속에 완전히 캡슐화 된 액체 복구제와 함께 표면 위에 무작위로 형성된다. 이 때 캡슐은 손상시에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록 기계적 손상에 매우 취약하도록 만들어지며, 균열로 인한 손상 시에 비드(bead)는 파열되고 두 개의 선구물질 액체는 손상 부위로 방출되고 균열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의 폴리머 코팅 부근에서 혼합된다.

* 참고문헌
[1]최우성, “풍력에너지의 경제성 및 성장 가능성”, 전력기술동향 통권 63호 (2011)
[2]박지상, 정성훈, 황병선“,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설계/해석 및 시험 평가 기술”, 기계와 재료 (2007)
[3]‘풍력발전 기술과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대우엔지니어링기술보 (2005)
[4]‘해외풍력사업 설명회’, 해외사업본부 (2011)
[5]‘Wind turbine blade materials’, SuperGEN WIND(2010)
[6]정재승, 이종찬, “자가 복원성 고분자의 연구 동향”, NICE, 제29권 제1호 (2011)
[7]R.S Trask, "Self-healing polymer composites : mimicking nature to enhance performance" (2006)
[8]기초정보 조사 보고서, WIPS (2011)
* 작성자
최우성 : 선임연구원/그린에너지연구소 woosung@kepco.co.kr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www.kep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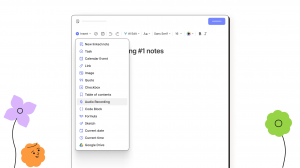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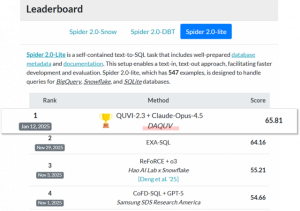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스페셜리포트] 시바우라기계, 스마트 기술력 총망라한 ‘솔루션페어 2025’ 성료](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7lXkxWJPCh.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


![[인터뷰] (주)마토코리아, 산업용 집진기 기술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시 실현](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m4tzpGdJWZ.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