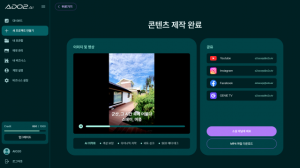<사진. (a) OLED 구조. 이 디바이스는 유리 기판 상에서 인듐 주석 산화물 위에 제작되었다. 아연 산화물이 인듐 주석 산화물 위에 증착되어 음극을 형성한다. 수산화바륨 또는 탄산 세슘의 중간층이 일함수를 낮추고 전자 주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스핀 코팅 방법으로 증착되었다. 발산층을 위해서, 복합 폴리머 박막이 비슷한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증착되었다. 담금질 후에, 높은 일함수 양극이 증기 증착에 의해서 추가되었다. (b) 발광 및 출력 효율 대 작동 전압. 내부 그림은 작동 OLED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고체 상태 조명 기술을 위한 폴리머 기반 하이브리드 LED
밝기, 크기, 색상, 효율, 수명 그리고 광범위한 응용성 면에서, 유기 반도체에 기반한 LED는 전통적인 LED 기술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OLED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작은 면적의 디스플레이에 적용되었다. 다음 목표는 고체 상태 조명이다. 형광 또는 인광 물질에 기반한 현대 OLED는 엑시톤의 재결합으로 빛을 방출한다. 전하 운반자가 전기적으로 유기 반도체에 주입되면, 하나의 싱글릿 엑시톤이 모든 세 개의 트리플릿 엑시톤에 대해서 형성된다.
OLED의 내부 양자 효율은 전하 운반자 균형, 스핀 통계 그리고 광루미네슨스 효과에 의존한다. 싱글릿 및 트리플릿에 의한 방출은 인광 물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인광 OLED는 거의 100%에 달하는 내부 양자 효율을 보인다. 역으로 단지 25%의 IQE가 전형적으로 형광 OLED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단지 싱글릿 엑시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조명의 경우, 조명 준위들은 디스플레이 응용에 비해서 매우 커야 하기 때문에 형광 물질이 OLED에 더 적합하다. 더구나, 형광 물질은 더 높은 전류 수준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전하를 청색 방출기에 주입하여도 문제가 남아있게 된다.
인도와 영국의 연구진은 ZnO와 폴리플루오렌 기반 폴리머 물질을 음극과 방출층으로 이식함으로써, OLED의 결과적인 출력 효율을 3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포토닉 구조를 개발하였다. 이런 디바이스에서 광손실의 감소는 유사한 구조에 기반한 광학적으로 펌프된 레이저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 연구진은 현재 전기적으로 펌프된 저렴하고 휴대하기 간편한 다중색 유기 반도체 레이저 모듈을 개발 중이다.
올바른 접촉 공학과 포토닉 기하구조를 이용하여, 이들 연구진은 성공적으로 형광 물질의 전형적인 낮은 IQE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들 연구진은 예상한 것보다 3배 더 좋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형광 폴리플로렌에 기반한 중합 물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진은 폴리플로렌 파생물을 사용하였다. 고체 상태 패킹을 조절하는 것은 폴리머의 주요체인 상에서 사이드 그룹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고 더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 이들의 연구는 오랜 수명의 트리플릿 엑시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는 효율 향상이 가능하도록 매우 중요한 광물리학적인 직관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연구진은 말하였다.
전하 운송자가 전기적으로 주입되면, 이런 트리플릿 엑시톤은 싱글릿보다 3배 더 높은 비율로 생성된다. 그 결과 특정한 정상 상태 조건 하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오랜 수명의 트리플릿 엑시톤은 싱글릿 엑시톤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충돌한다. 더 많은 싱글릿으로 변하는 비율 때문에, 이들 연구진은 스핀 통계에서 예측된 것 이상의 효율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음극이 하단 전극으로 작동하고 양극이 상단 전극을 작동하는 이들 연구진의 역디바이스는 손실 없는 전자 주입 접촉과 아연산화물/F8BT 경계면상에 근접한 재결합 영역을 제공한다. 비록 이 디바이스에서 방출층은 비현실적으로 표준 OLED에 비해서 두껍지만, 작동 전압은 비교적 낮다는 특징이 있다.
효율적인 전자 주입을 위해서, 이들 연구진은 탄산 세슘과 수산화바륨 용액으로 중간층을 처리하여 낮은 일함수를 ZnO 표면 상에 형성시켰다. 이런 낮은 일함수는 전자 주입을 증가시키고 경계면에서 정공을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화층을 주입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 주입층에 비해서 더 높은 전류 처리 능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습기 장벽으로서 역할하고 광산화를 방지함으로써 디바이스에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산화 주입층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의 지원하는 광구조이다.
연구진은 또한 광학적으로 펌프된 레이징을 시연하였다. 이런 디바이스의 개발에서, 연구진은 F8BT기반 OLED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제작 공정을 이식하였다. 그러나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가 홀로그래픽 격자를 사용하는 방출층에서 굴절률의 1차원 주기적인 변화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높은 굴절률 때문에, 정확한 음극 두께를 도입하는 것은 광학 모드의 제한을 허용한다. 더구나, 그것의 광구조에 의한 방출층에서 광손실의 감소는 광학적인 펌프 레이징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 연구진은 펄스 UV 레이저 소스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안에서 재료를 여기시킴으로써 주름진 F8 박막으로부터 레이징을 유도할 수 있었다. 이런 레이저의 임계는 수 nJ 영역이며, 따라서 비응집된 고출력 LED를 사용하여 펌프될 수 있다. 이런 디바이스는 다양하고, 휴대 가능하며, 경제적인 레이저 소스를 현장 진단용으로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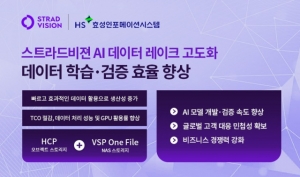



![[전문가기고] 페트병 회수기 업체들의 저가 경쟁에 신음하는 페트병 재활용 산업](https://file.yeogie.com/img.news/202406/md/b1aZhEcAwq.png)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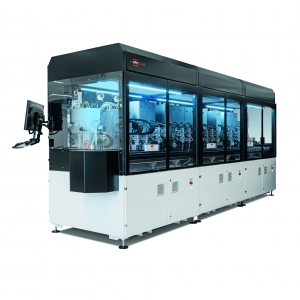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