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천연고무용 압출기가 등장한지 약 120년, 염화비닐 파이프의 양방향 2축 압출기로 양산이 시작된지는 약 70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열 열화성 염화비닐수지를 압출성형하기 위해서는 용융수지가 체류하는 곳의 개수를 줄여 극력저온으로 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30년부터 유럽에서 연구되었으며, 이(異)방향 2축압출기와, 회전하면서 전후방향으로 움직이는 부스코니더(Buss Ko Kneader), 유성 롤러 믹서(Planetary Mixer) 등이 이때부터 등장했다.
이후 Werner&Pfleiderer에 의해 동(同)방향 2축압출기가 1957년에 산업화되었다. 이는 압출기의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염화비닐수지를 대신해 열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폴리프로필렌(PP)이나 폴리에틸렌(PE)의 보급이 시작됐다. PP에 가교 고무를 미분산시킨 동적가교기술을 미국의 몬센트사가 개발한 후부터는 동방향 2축압출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2. 압출성형장치·기술 트렌드
스크류의 구성을 <그림1>에 표시했다.

(1) 압출기의 종류
압출기의 종류를 <표>에 표시했다. 현재는 동방향 2축 압출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2) 압출 라인
<그림2>는 일반적인 필름 제조 압출기를 설명하고 있다. 중량제어식피더(Gravimetric Feeder 또는 Loss in Weight Feeders)에서 압출기에 투입된 수지는 열과 전단력으로 용융시킨 후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스크린(Screen, <그림3>)을 거쳐, 기어펌프(Gear Pump or Melt Pump, <그림4>)로 일정량 수지를 꺼내어 T다이(T die, <그림5>)로 공급시킨다.




과거의 기어펌프는 데드스페이스가 많아 색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압출수지 양(量)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어펌프 앞 수지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기어펌프 앞 수지의 압력을 계측하여 인버터에 의해 회전을 제어시킨 교류모터(AC Motor)에 피드백을 하고 스크류 회전수를 컨트롤해야 한다.
기어펌프 앞의 수지압력신호는 동시에 중량제어식피더에도 피드백시켜 수지 공급량의 제어도 동시에 이뤄진다. T다이로 시트 형태로 압연된 시트는 롤에 끼워 표면 성형을 시킨 후 후미(厚味)를 β선, X선, 와전류(渦電流), 레이저 측정기로 계측한 후 T다이의 가장자리에 1인치 간격으로 장치시킨 히트볼트(Heat Bolt)에 피드백시키고 발산각을 조절하여 폭 방향의 두께를 제어한다. 히트볼트의 가동범위는 약 0.8㎜이다<사진1>. 이는 길이, 폭 방향 전자동 두께 제어 시스템보다 ±1% 이상의 제어가 가능해졌다. 처음 압출기를 도입한 기업도 간단하게 다루기 위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필자가 약 30년 전에 압출기를 도입했을 때 두께의 정도는 칼렌더 성형의 ±3%, 베테랑 이 작업한다 해도 ±5%였다. 일본의 산업기기전반에 응답이 좋은 교류 모터와 인버터의 등장이 자동화, 에너지 저감, 저비용, 콤팩트화를 추진했다.
유럽에서는 인버터의 응용이 늦다. 예를 들어 에어컨의 인버터화율이 일본의 경우는 100%지만 유럽의 경우는 약 13%, 미국은 0%에 불과하다. 사실, 미국 전 영토의 에어컨을 인버터화하는 것만으로 꽤 많은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일 수 있다.
인젝션의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유압제어방식이 이제서야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3,000톤 규모까지 전동화(모터 구동)를 진행하고 있다. 1/3의 에너지에서 생산 스피드는 3배 이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범퍼 케이스는 유압(油壓)의 경우는 100s/shot이지만, 전동은 30s/shot이다. 기본구조는 유럽에서 발안되어 일본이 전기적 개선을 추가해 기계에 개량하고 있다.
<그림6>은 더블 플라이트라고 불리는 2조나사의 응용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더블 플라이트를 가진 스크류로, 상단이 일반적인 풀플라이트(Full Flight)라고 불리는 타입이다. 하단의 스크류는 메인 플라이트를 따라 서브플라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수지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아 용융이 빠르다.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니딩 디스크(Kneading Disk, <그림7>)를 스크류 중앙부에 장착한 동방향 2축압출기는 제2차 대전 중 이탈리아에 있던 독일인인 Farben이 개발했다. 전쟁 후 BASF로 이동하여 1957년 Werner and Pfleidrer(現Coperion)에 라이선스를 제공, ZSK라고 불리는 상품명으로 출시되었다. Coperion은 동방향 2축압출기의 전 세계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부터 스크류는 세그먼트 방식을 채용했다. 배합에 맞는 스크류 구성에 간단히 재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방향 2축압출기 수지에 전단을 부여하는 것은 주로 스크류 간극을 실행하기 위해 실린더측의 압력이 낮은 실린더도 세그멘트 방식을 선택한다. 스크류는 수지 위에 실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늘릴 수 있다. 최근에는 L/D=144 타입이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 동방향 2축압출기는 2축 모두 우회전이다.
수지 공급부(피드)는 오른나사 세그먼트로 수지를 앞으로 보낸 다음 왼나사 세그먼트로 수지에 역류 방향의 힘을 주어(수지 자체는 역류까지는 가지 않음) 체류시킨 후, 니딩 디스크로 높은 전단(煎斷)을 부여하고 섞는다. 이후, 오른나사 세그먼트로 돌아가 빈틈을 만들어 탈기(脫氣)하는 기본구성은 약 50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는다.
압출 후 확폭장치로 종횡방향에 연신하는 것에 따라 강도를 높인 OPP(Oriented Polypropylene)필름이 활발히 제조되고 있다. 리튬 이온 2차전지의 세퍼레이트필름도 확폭장치가 달린 압출기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다층 압출기에 의해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다층화의 방법은 피드 블록 방식(Feed Block)과 멀티 매니폴드(Multi Manifold),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피드 블록은 T다이에 넣기 전에 수지를 적층(積層)하는 방식이다. 멀티 매니폴드는 T다이 안에 여러 층의 유로(流路)가 있어 각기 다양한 수지가 압연 후 라미네이트 시키는 방법이다<그림8>.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피드 블록 방식은 일반 T다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며 아주 얇은 층이 가능하지만 두꺼운 정도(精度)는 멀티 매니폴드 타입보다는 어렵다.
이방향 2축압출기와 이방향 2축코니컬압출기는 염화비닐의 감소에 따라 일본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3) 최신 압출기
초임계유체(SCF ; Super Critical Fluid)가 용이한 압출동시발포체의 제조가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고압증기발전장치로 유명한 스위스 중기계 메이커인 Sulzer사가 SC(Super Critical)라는 표현을 1956년 공개, 허가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계열 회사인 Sulzer Chemtech에서 Optifoam으로 장치를 판매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압출기 메이커인 SML과 독일의 IKV(Institut fur Kunststoff Verarbeitung : 아헨공학대학교의 플라스틱 연구기관)이 압출발포성형의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의 베이커리인 CSM 계열회사인 Purac Biochem이 폴리 유산초임계 발포체를 개발하여 Bio-Foam으로 양산하고 있다. 이는 발포 폴리스틸렌의 대용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의 Dr.Suh가 초임계류체를 가진 발포에 관한 기본 특허를 취득했다. 현재 보스톤 TREXEL사가 특허의 독점실시권을 소유하고 있다. MIT의 기본 특허를 처음의 2,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여 제조물 특허도 취득하고 있다. MuCell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메이커에 라이센스를 주고 있다.
TREXEL과 Sulzer Chemtech의 초임계류체발포 관련의 분쟁에 관련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는 다루기 어렵다. 단, TREXEL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Sulzer Chemtech의 Optifoam기를 도입하여 발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메이커에 라이선스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사출·압출기 메이커 대부분이 TREXEL로부터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MuCell의 정보는 넘쳐나 Optifoam의 압출발포 예를 소개한다<그림9>. 지금까지의 압출기에 부착이 가능하며, 초임계류체를 주입 후 스타틱믹서를 설치하는 것에 따라 세포를 미세화하는 것이 가능하다<사진2>. 일본의 각 메이커는 스타틱믹서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3. 맺음말
압출기에 대해서는 중국, 대만, 인도의 메이커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격 면에서는 이 나라들이 우위일수 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독일 아헨공과대학교의 IKV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기관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필자 : TPE테크놀로지(주) 니시 이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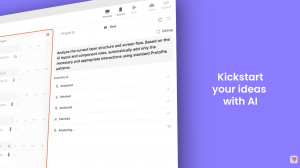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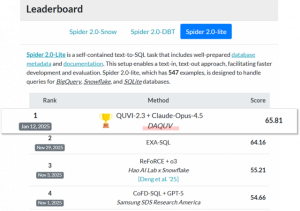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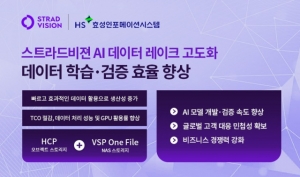
![[인터뷰] (주)마토코리아, 산업용 집진기 기술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시 실현](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m4tzpGdJWZ.jpg)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KOPLAS 2023 Preview] 삼보계량시스템(주), 플라스틱 펠렛 'PLATONⅡ'로 고객 눈길 사로잡다](https://file.yeogie.com/img.news/202302/md/4QINfMIE2G.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