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exible OLED, 2013년부터 시장출시 본격화
Flexible OLED용 기판 핵심특허 동향
Flexible Display는 가볍고 잘 깨지지 않으며 휴대가 편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IT 제품에 적용이 기대되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이다. 따라서 Flexible Display의 상용화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영역을 대폭 확대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lexible Display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OLED 방식인데 최근 Flexible OLED에 대한 기술진보가 빠르게 진행되어 2013년 초에는 Flexible OLED가 채용된 모바일 제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 Display는 화면에 유리가 들어가 있어 딱딱하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경우 화면이 깨질 수 있다. Flexible OLED는 유리 화면 대신 플라스틱(폴리아미드 수지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면이 깨지지 않고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모바일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Flexible OLED를 구현하기 위한 기판으로는 플라스틱(고분자 Film), Thin Glass, Metal Foil 등이 검토됐다. Thin Glass는 광투과도, 수분 차단성이 뛰어나며 고온공정상의 안정성, 기존 공정과의 유사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깨지기 쉽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큰 단점이 있다. Metal Foil은 습기차단성이 우수하고 내열성, 내충격성 등이 좋으나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표면이 거칠고 단열코팅 등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플라스틱 기판은 높은 유연성, 가공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매력적인 소재로 여겨지고 있으나 열에 약하고, 가스 및 습기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AMOLED의 제조 공정은 4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Flexible 구현을 위해서는 가스 및 습기를 차단하면서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기술이 최근 많이 진전되면서 Flexible OLED 제품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는 Flexible AMOLED 패널 양산을 위해 2011년 8월에 Ube Kosan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Flexible 기판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PI(Polyimide)를 내재화할 계획이다.
OLED 조명 발광재료 핵심특허분석
 LED는 청색, 적색, 녹색 등의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기술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백색 OLED(이하 WOLED)의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1980년 말부터 꾸준히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최근에는 20~30lm/W의 WOLED 소자를 발표하여 LED와 더불어 차세대 조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LED는 청색, 적색, 녹색 등의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기술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백색 OLED(이하 WOLED)의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1980년 말부터 꾸준히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최근에는 20~30lm/W의 WOLED 소자를 발표하여 LED와 더불어 차세대 조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OLED 조명은 LED와 마찬가지로 환경적으로 수은 등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고효율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명보다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면광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구현, 넓은 적용범위(투명조명, Flexible 조명)가 가능하여 시장 잠재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
OLED 조명은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빛을 비추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 mm ~ 수십 크기의 광원을 배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주로 백색이 사용되며 OLED 디스플레이(AMOLED)와 달리 TFT가 필요하지 않는다.
또한, OLED 조명은 연색지수(CRI, Color Rendering Index), 대면적 발광, 전체전력효율 등의 특징적 요소가 있다. 특히 색상의 구현 능력을 나타내는 연색지수는 효율 및 수명과 더불어 OLED 조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LED 조명 핵심특허 분석: Remote Phosphor
LED는 화합물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해 전기를 빛으로 전환하는 반도체 소자로 기존 조명보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교체비용이 적으며 진동이나 충격에도 강하고 수은과 같은 유독물질의 사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기존 조명을 대체하는 신조명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기존조명 대체를 가속화하기 위해 저 Cost화와 더불어 LED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이중 Remote Phosphor 방식은 열의 발생과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LED의 백색광 구현 효율을 기존대비 약 30~40% 정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많은 업체가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INTEMATIX, CREE 등 일부 업체들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으며 특히, 형광체 전문기업인 INTEMATIX는 자사 홈페이지 및 You-Tube에 Remote Phosphor 관련하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IP에 대한 홍보와 IP 라이센싱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놓고 기술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Cree와 Philips는 Remote Phosphor가 포함된 LED기술에 대한 상호 특허 사용 라이센싱을 체결하였으며,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의 하나인 ABL IP는 이 분야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형광체 분야는 몇몇 기업들이 특허장벽을 구축해 놓은 분야 중의 하나로, 이미 분쟁 중인 기술이 상당 건 있으며 계속하여 새로운 분쟁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Remote Phosphor 기술분야에서도 한국, 일본, 대만의 주요 LED 기업들은 다소 늦게 연구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Remote Phosphor 기술과 관련하여 또 다른 특허분쟁이 예상된다.
리튬 이차전지 핵심 특허분석: 분리막 코팅 및 표면개질
 리튬 이차전지에서는, 폴리올레핀 계열 분리막이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전지의 고용량화 및 고출력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튬 이차전지에서는, 폴리올레핀 계열 분리막이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전지의 고용량화 및 고출력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지 안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온에서 열 수축이 심하며 물리적으로도 취약한 폴리올레핀 계열 분리막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전지의 고온 저장, 과충전 등은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과 관련성이 높고 못 관통, 이물질 등에 의한 전지 안전성 이슈는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지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해액에 대한 젖음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같은 응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지의 저가화에 대한 요구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전지의 경우, 다른 소재들보다도 분리막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적인 이슈 이외에 이에 대한 해결 역시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 폴리올레핀 계열 분리막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튬 이차전지 핵심 특허분석: NCM 양극재
 IT용 소형전지뿐만 아니라 EV의 메인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ESS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IT용 소형전지뿐만 아니라 EV의 메인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ESS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기의 전원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전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또한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됨에 따라 그 동력원으로 리튬 이차전지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튬 이차전지의 구성요소 중 양극재는 전지 내에서 전지의 용량 및 성능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물질로, 리튬 코발트 산화물(LCO)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며, 원료로서 사용되는 코발트의 자원적 한계로 인해 고가이고 전기 자동차 등과 같은 분야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LCO를 대체하는 양극재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중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산화물(NCM)은 안전성과 수명 및 가격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어 최근 LCO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IT용 소형 전지에서는 주력으로 있고, LG CHEMICAL에 의해 NCM 양극재를 사용한 리튬전지를 탑재한 전기자동차 GM Volt가 출현하면서 NCM 양극재는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인산철계 양극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력저장용 시장에서도 NCM 양극재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양극재 및 이차전지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NCM 특허 출원 경쟁을 뜨겁게 진행 중이다. NCM 양극재의 개발은 비싼 코발트의 대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안정성, 고출력, 고에너지밀도 등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SNE Research에서는 이러한 리튬 이차전지의 NCM 양극재에 대한 핵심특허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 6월 4일까지 발행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리튬 이차전지 NCM 양극재 분야의 특허를 대상으로 모집단 1,429건 중 326건의 유효특허를 선별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리튬 이차전지 NCM 양극재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과 관련 핵심특허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튬이온 이차전지 NCM 양극재에 관한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특허가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한국, 미국, 일본에 골고루 특허출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2000년대 중반, 한국은 2000년대 후반, 미국은 최근에 높은 출원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ED 조명 신뢰성 향상 핵심 요인분석 및 평가 방법
LED는 반도체 공정기술과 광기술이 융합된 21세기 새로운 광원으로 기존의 광원(백열등, 형광등)에 비해 에너지 절감효율이 90%로 높은 고효율 광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LED의 사용수명은 매우 길며, 반영구적인 광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자제품에 여러 가지 고장모드로 인해 특성 열화가 생기는 것처럼 LED 조명에서도 특성 열화가 발생한다. LED 조명의 수명은 백열전구와 같이 필라멘트가 단선됨으로써 결정되는 수명이 아닌, 점등 시간에 따라 구성 소재가 열화하여 광속이나 특성의 초깃값에서의 변화로 결정된다.
특히, LED 조명에 많은 중소업체가 참가하고 LED 제품들의 구조가 고도화, 집적화, 다기능화되고 소재와 부품 및 조립 기술 등의 면에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LED 제품의 수명 및 발광효율 등에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의 신뢰성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제품의 신뢰성과 수명은 개발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목표이며 이를 위해 신뢰성 기술은 제품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안전성, 내구성 및 설계 신뢰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신뢰성 확보에 대한 Solution은 고장분석(Failure Analysis)을 통하여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신뢰성 설계기법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품질에 서 믿을만한 제품, 즉 신뢰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Ultra Capacitor 최신 기술 및 시장 전망
 Ultra Capacitor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슈퍼 캐패시터, 전기화학 캐패시터, EDLC(전기이중층캐패시터)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Ultra Capacitor는 전기이중층의 전하흡착을 이용한 EDLC, Redox 반응을 이용한 Pseudo Capacitor, 그리고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이용하여 만들어진 Hybrid Capacitor로 구분된다.
Ultra Capacitor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슈퍼 캐패시터, 전기화학 캐패시터, EDLC(전기이중층캐패시터)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Ultra Capacitor는 전기이중층의 전하흡착을 이용한 EDLC, Redox 반응을 이용한 Pseudo Capacitor, 그리고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이용하여 만들어진 Hybrid Capacitor로 구분된다.
고체전극과 액체전해질 사이의 계면에 형성되는 전기이중충에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개념은 1800년대 후반부터 알려져 왔다. 전기이중층을 이용한 최초의 전기저장장치는 GE의 H.I 베커에 의해 1957년 보고되었다.(미국 특허 2,800,616)
이후 오하이스탠다드 석유회사(SOHIO)의 화학자 로버트 A. 라이트마이어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형식의 장치를 발명하여 1962년 특허(US3,288,641)를 출원, 1966년 11월 등록되었다.
1970년 SOHIO의 도널드 L. 부스에 의한 후속특허(미국 특허 3,536,963)를 통해 전기화학캐패시터 기술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7년 NEC는 수년간 디자인 변경을 통해 컴퓨터의 휘발성 시계칩과 CMOS의 백업전원장치용 슈퍼캐패시터를 상용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기화학캐패시터가 상용화되었으며, 이후 35년 동안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대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Ultra Capacitor는 Consumer Electronics 제품에 주로 응용되면서 시장을 키워왔다. 대표적 응용제품 중 하나가 Mobile Phone이다. Memory, Time Clack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들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Ultra Capacitor 시장은 2011년 전 세계적으로 4,800억원 규모에 달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Transportation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매년 평균 11.3% 성장하여 2015년에는 8,400억원, 2020년에는 1조2,5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Ultra Capacitor를 전정용량에 따라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바, 1F 이하의 초소형 및 소형 시장은 소폭 성장이 예상되지만 1F 이상의 중형 및 대형의 성장이 전망된다. 2015년 이후에는 특히 1,000F 이상의 초대형 시장이 Transportation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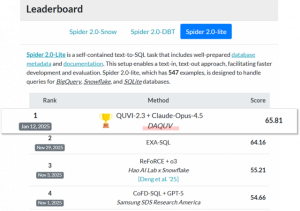

![[인터뷰] (주)마토코리아, 산업용 집진기 기술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시 실현](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m4tzpGdJWZ.jpg)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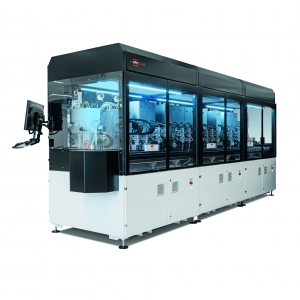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