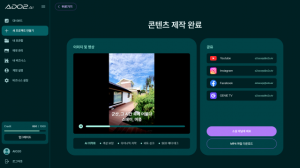Robot Navigation Technology and Its Standardization Trends
로봇주행 기술 및 표준화 동향(下)

로봇 주행은 환경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경로를 생성하고 제어하는 기술 체계를 의미한다. 이미 로봇청소기, 군용로봇, 무인주행 자동차, 농업용 무인트랙터 등 개인서비스 로봇에서 전문서비스 로봇 영역까지 폭 넓게 적용되는 이 기술의 핵심 요소기술 동향 및 산업, 표준화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로봇주행의 중요성과 기술확보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목차> |
Ⅱ. 로봇주행 산업 동향
개인용 서비스 로봇의 경우에 로봇주행 기술이 적용된 제품군은 청소로봇, 제초로봇, 탑승로봇, 가정용 보안로봇으로 구별된다.
청소로봇은 미국의 iROBOT사에서 개발한 룸바 시리즈가 유명하다. 국내에서 개발한 청소로봇의 경우 천장 영상 특징점을 이용한 SLAM 기술이 적용되어 실내 2차원 공간에서 수행하는 고난이도 주행 기술이 구현되어 있다. Neato Robotics사는 저가형 LIDAR를 탑재, SLAM 기술을 구현해 매우 효과적인 청소 경로를 생성한다.
잔디깍기로봇의 경우 주로 개인 정원, 골프장 등의 잔디를 자동으로 깎는 로봇으로 이스라엘의 Friendly Robotics, 스웨덴의 Husqvarna, 미국의 Precise Path에서 상용화했다. 대부분 잔디장 주변에 전선을 설치해 작업영역을 인식하도록 하며(위치인식 및 맵핑), 임의의 주행경로를 생성해 잔디를 깎는다.
Precise Path사의 RG3는 이와는 다르게 잔디장에 4개의 비컨을 설치하고 초음파와 적외선센서를 활용해 위치를 인식하며, 정밀한 주행동작을 제어한다.
탑승형 로봇은 프랑스의 RoboSoft, 네덜란드의 2getthere에서 상용 제품을 개발했다. RoboSoft의 경우 전자유도 혹은 GPS 기반의 위치인식, 레이저 혹은 초음파 기반의 주행제어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2getthere사는 주행공간의 바닥에 마그네틱 모듈을 설치해 일종의 추측항법으로 주행한다.
가정용 보안로봇은 일명 텔레프레즌스 로봇으로 스웨덴의 Giraff Technologies, 홍콩소재 WowWee 등에서 개발했다.
Giraff Technologies 전자의 경우 원격제어를 통한 수동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WowWee의 Rovio는 미국 Evolution Robotics사의 NorthStart 센서를 이용해 정밀한 위치인식이 가능하다.
한편, 전문서비스 로봇의 경우에 로봇주행 기술이 적용된 제품군은 보다 다양하며 시장의 규모도 여타 제품군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로봇주행이 적용된 제품군은 농업, 물류, 재난/방재, 국방로봇이 대표적이다.
농업용 로봇의 경우에 주로 비정형환경에서 동작해야 하므로 자율주행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반면, 센서류 및 시스템이 고가이다.
예를 들어, 로봇 트랙터의 경우 미국의 John Deer, 카네기 멜론대, 일리노이대, 일본의 홋카이도대, 동경대, 국립농업연구센터, 국내에서도 농업기계화연구소 등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가의 GPS 장비, 레이저 스캐너 등이 소요되어 본격적인 시장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고령화 대비, 노동비용 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뚜렷한 목적과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술을 보다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물류로봇의 경우에는 사무실, 병원, 공장 등에서 재료나 자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미국 Aethon사의 The Tug, 스위스 Swisslog사의 TransCar 등이 대표적이다.
두 경우 모두 건물 내부의 전자지도를 내장하고 있으며 로봇에 장착된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 감지 및 회피기동을 한다.
또한 천장에 별도의 위치인식용 비컨을 설치해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류로봇의 경우에는 위치인식, 지도 기반 로봇주행의 전형적인 구현모습을 보인다.
재난/방재로봇의 경우 화재진압, 감시정찰로봇이 포함되며 일본 Komatsu, 국내의 경우 호야로봇, 동일파텍에서 화재진압로봇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원격조작으로 주행을 한다.
감시정찰로봇의 경우 일본의 Tmsuk, 세콤, 스웨덴의 Rotundus 등 비교적 많은 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했다. 대부분의 경우, 감시정찰 구역에 대한 지도를 미리 내장하고 있으며 실외의 경우에 GPS 정보와 미리 알고 있는 구조물의 레이저 센서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위치인식을 수행한다. 실내의 경우에는 벽면을 레이저 센서로 인식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국방로봇, 건설로봇 등 다양한 적용제품이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로봇제품군의 주행 기술 구현방식과 유사하다.
즉, 전문서비스 로봇의 경우에는 SLAM과 같은 자동지도작성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별도의 위치인식 비컨이나 알려진 지도상의 지형지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서비스 로봇의 경우 주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도제작 비용 등이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작업 생산성 증가, 비용절감 효과에 의해 상쇄되고 작업결과의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Ⅲ. 로봇주행 표준화 동향

▲ 위치 정보를 이용한 로봇 응용 서비스 예시
현재 로봇주행 기술의 표준화는 하위 기술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실제로 주행 기술의 특성상 지난 회 소개한 기술들이 하위요소로 취급되었으나 각 하위 요소기술 자체가 비중이 큰 연구주제이다.
우선, 로봇 위치인식기술은 민간표준단체인 OMG를 통해 2010년에 최종 표준안으로 등록되었다.
로봇 위치인식기술의 OMG 공식명칭은 ‘Robotic Localization Service(이하 RLS)’ 규격으로 ETRI, 삼성전자, 일본의 JARA가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ISO에서는 GPS Positioning에 대한 국제표준이 확립되어 있고 GIS 분야에서도 위치 관련 표준안이 제정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로봇주행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밀도(Level of Detail)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로봇 응용에 적합한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OMG RLS는 이러한 배경으로 2006년도부터 표준화 활동이 시작되었고, 직접적인 목표인 로봇 위치인식뿐만 아니라 센서 네트워크, 네트워크로봇, 로봇을 포함한 일반적인 위치인식 응용 서비스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OMG RLS를 이용해 기존의 ISO, GIS규격의 Positioning 및 응용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
RLS의 특징은 로봇주행과 관련된 고유의 데이터 처리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즉, 전역 좌표계를 포함해 이동 좌표계 설정, 좌표계 간의 변환, 위치 정보에 대한 에러 확률표현, 이종 센서 간의 융합구조를 기술하고 있다.
RLS 표준규격을 통해 개별 로봇센서는 RLS 단위 모듈로 표현이 된다.
특히, 로봇주행의 경우에 인코더와 같은 Odometry 정보, 절대위치인식센서 정보(예를 들어, StarGazer), 레이저 매칭 기반의 로봇 위치 인식 정보가 RLS 단위 모듈이 되고, 센서융합을 위한 별도의 RLS 모듈과 연결시킴으로써 로봇 응용에서 필요한 최종적인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데이터 구조를 구현하게 된다.
사용자 혹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각 RLS 모듈에 대한 인터페이스 규격만을 준수하면 손쉽게 위치인식 정보를 획득하게 되며, 각 RLS 모듈에 고유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2010년부터 IEEE를 통해 로봇지도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IEEE RAS가 기술후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Robot Map Data Rep-resentation for Navigation(이하 MDR)’이라는 명칭으로 표준화를 위한 워킹그룹이 구축되고 있다.
이것은 2011년 하반기에는 완료가 되어 2012년부터 본격적인 표준안작성을 위한 워킹그룹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MDR 워킹그룹의 작업범위는 현재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로봇지도 관련 용어정의
·관련 업계의 로봇주행용 지도활용 사례 및 타 표준화 단체의 선행규격 분석
·2D 공간에 대한 격자지도, 위상지도에 대한 표준안 작성
·로봇을 포함한 컴퓨터, 디바이스 간 지도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수립
특히, 3차원 지도에 대한 업계, 학계의 관심이 높은 상태이나 우선적으로 비교적 규격안 수립이 수월한 2차원 공간에 대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지도 표준화에는 국내에서 ETRI와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NIST, PARC, 일본 AIST 등이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공간지도 표준안과 관련해 OGC에서 CityGML, IndoorGML 등을 표준 제정했거나 진행 중인 상태로, 로봇용 지도의 경우 특히 실외환경에 대해서는 기존 안의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로봇용 지도에 대한 표준안이 확립되면 로봇주행기술에 대한 핵심요소는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는 셈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서비스 로봇 제품의 경우에 로봇주행 기술은 대부분 2차원 공간 혹은 2차원 공간으로 근사가 가능한 단순한 3차원 공간(일반 포장도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3차원 응용 기술의 대상인 농업로봇, 국방로봇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민간표준안을 채택하기에 어려운 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로봇용 지도의 경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작업의 범위가 2차원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향후 개정을 통해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
|
|
|
▲ 주행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로봇 제품
Ⅳ. 로봇주행 기술 향후 전망
지금까지 로봇주행 기술과 주행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핵심요소 기술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로봇주행기능을 탑재한 산업 응용 제품 동향과 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증대 요구 등의 이유로 기존 산업 및 서비스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로봇주행기능은 로봇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이동성(Mobility)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의 개량 혹은 신제품의 등장을 기대하게 만든다.
로봇주행은 최근의 무인주행차량 기술, 군사로봇, 물류/교통로봇, 그리고 향후 농업로봇에 이르기까지 기술 성숙도에 따라 광범위한 적용시장을 창출하는 기술로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관련 시장의 확대를 위해 대형 실내 공간 내 자율주행 및 정형/비정형 실외공간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로봇주행에 사용되는 비전, 3D 레이저 스캐너 등 핵심센서 및 부품에 대한 기술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및 확보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내용은 지면상의 이유로 재편집되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필자>
유원필 ETRI 공간인지연구팀 책임연구원
최성록 ETRI 공간인지연구팀 연구원
이재영 ETRI 공간인지연구팀 선임연구원
박승환 ETRI 공간인지연구팀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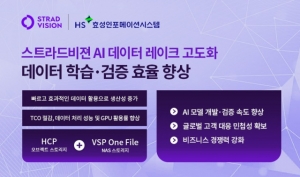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