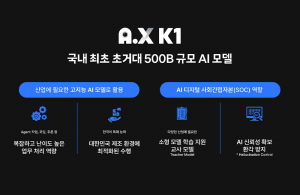*자료 : 화학소재정보은행
*필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치영 박사
<편집자 주>
신규 고분자를 설계하고 재료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고분자 작용기 간의 비공유결합, 사슬의 초분자 상호작용을 엄밀하게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새로운 고분자의 범주로 주목 받고 있는 초분자성 고분자(Supramolecular Polymer)의 최신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나노재료와의 계면 특성 제어를 통한 새로운 복합소재 개발에 기여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Ⅰ. 서론
비공유결합은 어떤 계 내의 여러 분자들이 열역학적 안정 상태로 수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고분자 재료의 계면 특성은 근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공유결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제어하는 것은 구조뿐 아니라 물성을 조절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비공유결합은 단일결합으로는 매우 약하지만, 시스템의 ‘제어’ 및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나일론(Nylon)은 아마이드(Amide) 작용기 간의 수소결합에 의해 유도되는 결정성 등으로 인해 강도 및 관련 물성이 매우 향상된다. 보다 단순한 고분자인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은 Van Der Waals 힘에 의해 Aliphatic Chain들의 결정화가 이루어지며, 분자량 및 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그 물성 또한 극명히 달라진다. 따라서 신규 고분자를 설계하고 재료 특성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고분자 작용기 간의 비공유결합, 사슬의 초분자 상호작용을 엄밀하게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고분자의 범주로 주목받고 있는 초분자성 고분자(Supramolecular Polymer)의 최신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나노재료와의 계면 특성 제어를 통한 새로운 복합소재 개발에 기여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고분자 물리화학에서 잘 접근되지 않은 초분자 화학적 측면에서 고분자의 접힘이나, 입체 구조 제어를 통한 고차원 자기조립 거동 및 물성 향상과 관련된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Ⅱ. 본론
초분자성 고분자는 단분자 혹은 올리고머(Oligomer), 고분자 등이 비공유결합에 의해 반복단위가 증가하고, 점도 등이 향상됨에 따라 고분자와 유사한 화학적 구조나 물리적 거동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광범위한 범주의 초분자성 고분자를 고려하면, 이는 다소 제한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초분자성 고분자는 비공유결합의 화학인 초분자 화학(Supramolecular Chemistry)을 바탕으로 하며, 1990년대 초반 프랑스의 Lehn 교수 등이 초분자성 고분자의 개념을 보고하면서 고분자와 연관지어 고려되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 네덜란드의 Meijer 교수의 연구진이 과학지에 이에 대한 개념과 물리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결과를 냈고, 이후 많은 연구들에 영향을 끼쳤다.
초창기의 초분자성 고분자는 개념적으로 Telechelic Polymer(혹은 Oligomer)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기존 고분자의 형태를 모방한 다양한 형태의 초분자성 고분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고분자 재료로 실현하기 어렵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신소재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론에서는 고전적인 초분자성 고분자의 범주를 벗어나는 복합화된 구조를 지니는 초분자성 고분자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탄소나노재료와의 복합소재를 만드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기존의 고분자 거동 분석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던 고분자 단일 사슬의 접힘 제어 등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고분자 사슬의 입체구조 및 측쇄 작용기의 계면특성 제어에 대해 논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고분자의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물성을 지니는 재료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1. 고차원 구조체로서의 초분자성 고분자의 제어
기존의 초분자성 고분자는 블록 공중합체와는 달리, 서열이 제어되지 않았다. 영국 Bristol 대학의 Ian Manners 교수는 서로 다른 블록공중합체의 Micelle들이 마치 AB형 블록공중합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Cylindrical Co-micelle을 형성하는 AB형 초분자성 고분자의 개념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실린더 형태로 자기조립 가능한 Poly Ferrocenyl Silnae(PFS)에 기반한 임의의 A 블록공중합체로 Seed Micelle을 만들고, PFS에 기반한 다른 임의의 B 블록공중합체의 용액을 넣었다. 이 경우 PFS의 결정성에 의해 기존의 A 블록공중합체의 Seed Micelle로부터 B 블록공중합체들이 성장하는 Epitaxial Growth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초분자성 블록으로 구성된 Co-micelle이 형성되었다. 이 개념은 Seed Micelle의 구조 설계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복잡한 Co-micelle 구현이 가능하게 했다.

(그림 1) 두 가지 방식의 Crystallization-driven Self-assembly(CDSA)를 통한 정교한 나노파이버의 조립 거동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블록공중합체의 자기조립을 이용해 Comicelle을 구현한 Manner의 연구와는 달리, 미국 Northwestern 대학의 Stupp 교수는 실린더 형태의 긴 파이버로 자기조립 가능한 양친성(Amphphilic)의 펩타이드 단분자를 이용하여 복합화된 초분자성 고분자 구조들을 구현했다.
예를 들어 양이온성의 펩타이드 용액에 고농도·음이온성의 Hyaluronic Acid 용액 방울을 넣으면, 계면에서 양친성 펩타이드와 Hyaluronic Acid가 이온결합을 통해 복합체를 이루기 시작한다. 이어서 양친성 펩타이드의 소수성 꼬리들이 Van Der Waals 힘 등에 의해 안정화 되면서 계면과 Conformal한 방향으로 나노파이버들의 자기 조립체들이 정렬되어 포장되고 물질 투과가 제어 가능한 독특한 캡슐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세포배양이나 Assay 등에 응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A)PFS-b-PDMS 와 PFS-b-PtBA 블록공중합체의 화학구조. (B)P-H-P Triblock Comicelle을 위한 CDSA 과정에 대한 모식도(PFA: 주황색, PDMS: 적색, PtBA: 청색)
이와는 달리 양이온이 존재하는 용액에서 자기조립 가능한 양친성 펩타이드(펩타이드서열 : V3A3E3(COOH), C16 Alkyl Chain은 N-말단)가 양이온에 의해 겔(Gel)이 되는 현상을 Annealing과 칼슘 이온의 첨가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하고 Spinning함으로써 한 방향으로 펩타이드 나노파이버가 정렬된 Monodomain Gel을 구현했다. 이는 칼슘 이온의 전달을 한 방향으로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신경세포 재생 등에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그림 3>과 같이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 브러시 형태의 펩타이드 기반 고분자와 자기조립성 펩타이드가 복합적으로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Hybrid Polymer를 처음으로 구현했다. 따라서 이제 초분자성 고분자와 기존의 공유결합 기반 고분자가 상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복합체의 설계를 통해 다양한 응용 범위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 고분자 브러쉬와 비공유결합에 의해 자기조립된 나노구조체가 복합적으로 이루는 하이브리드 고분자 파이버 합성에 사용된 단량체 및 구조 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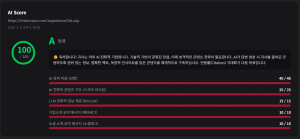




![[전문가기고] 페트병 회수기 업체들의 저가 경쟁에 신음하는 페트병 재활용 산업](https://file.yeogie.com/img.news/202406/md/b1aZhEcAwq.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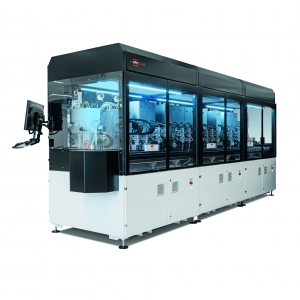

![[스페셜리포트] 시바우라기계, 스마트 기술력 총망라한 ‘솔루션페어 2025’ 성료](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7lXkxWJPCh.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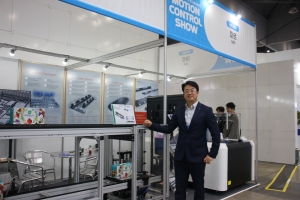


![[인터뷰] LS엠트론(주), 발포 사출로 자동차 도어모듈 생산 경쟁력 높인다](https://file.yeogie.com/img.news/202512/md/a3bSuT0jOx.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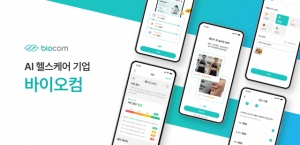
![[인터뷰] (주)아원, 친환경 윤활장치 기술로 글로벌 산업 설비 다각화](https://file.yeogie.com/img.news/202512/md/tQ74MJDSQZ.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