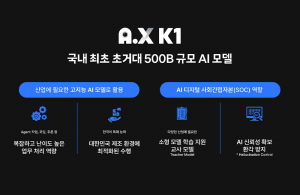(42)Plastic Story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발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
2000년 노벨화학상 수상업적(下)
앨런 맥디아미드, 히데키 시라카와, 앨런 히거 등 3명의 과학자는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1977년에 발명하고, 그 후 23년간 그것의 유용성을 입증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함으로써 2000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그 후 이들은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전도성 플라스틱: Conductive Polymers) 분야를 화학과 물리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도록 발전시켰으며, 이후 실용화 성공사례가 속출돼 소위 ‘플라스틱 전자시대’가 개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본지에서는 (사)한국과학문화진흥회에서 게재한 강박광 교수의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의 발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이라는 자료를 재조명해봤다.
* 자료. (사)한국과학문화진흥회

<그림1> 앨런 맥디아미드

<그림2> 히데키 시라카와

<그림3> 앨런 히거
100년 이상 걸린 비금속성 전기 도체 탐색
금속이 아닌 비금속성 물질에서 전기가 통하는 특성을 가진 재료를 찾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50여 년 전인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 후 개발된 비금속성 재료들은 대부분은 전기 전도도가 금속에 비해 매우 낮거나 실용화하기엔 단점이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실용화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전기 전도성이 금속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비금속 재료가 발명된 것은 그러한 노력이 110여 년이나 지속된 후의 1977년이었다.
1862년에 영국의 과학자 레더비(H. Letheby)는 염료의 재료인 ‘아닐린’이라는 비금속성 유기화합물을 실험하는 도중에 전기의 전도성을 보이는 물질이 생겨났다는 보고를 처음으로 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 1940년대와 50년대에 걸쳐서는 무기화합물인 실리콘이 부도체와 도체의 중간 수준의 전기 전도도를 보이는 반도체로 출현했고 그와 함께 유기화합물에 있어서도 반도체 수준의 전기 전도성을 보이는 유기 반도체가 발견됐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플라스틱에 있어서도 반도체 수준의 전기 전도도가 나타났으며, 이로써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그리고 플라스틱 등이 금속과 동등한 수준의 전도성 달성을 위해 3자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1970년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1975년에는 비금속성 재료로서 유황과 질소의 무기화합물인 (SN)X가 섭씨 영하 270℃의 극저온에서 금속 이상으로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현상(초전도 현상)이 나타졌으나 극저온이란 조건 때문에 실용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이후 1977년에 드디어 플라스틱 분야에서 사상 처음으로 상온에서 금속에 가까운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 플라스틱은 아세틸렌(Acetylene)이라는 가스를 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때까지 금속을 용접하는 용접가스로 사용되거나, 촛불을 대신하는 밝은 등불로 사용하던 가스였다. 이 아세틸렌가스가 중합이라는 특수한 화학반응을 거치면 (CH)X 즉 ‘폴리아세틸렌’이 된다. 이를 필름 형태로 가공한 후에 도핑(Doping)이라는 후속처리를 거침으로써 전기 전도성이 부여된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재료가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는가를 비교하는 단위인 전기전도도(S/cm)의 수치는 1억 분의 1이라는(10-8) 매우 작은 숫자에서 1백만이나(106) 되는 큰 수치로 나타난다. 부도체는 1억 분의 1 정도의 수치이고, 반도체는 1만분의 1 정도, 금속은 1천 이상이다. 1977년에 발명된 전도성 플라스틱(도핑된 폴리아세틸렌)은 약 3천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 수은과 비슷해 금속의 영역에 턱걸이해서 겨우 들어간 수준이었다. 이는 가장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인 구리나 은이 1백만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구리나 은의 1천 분의 1수준의 전기 전도도이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금속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가 통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과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모았으며, 금속과 플라스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재료가 출현함에 따라 그것을 이용해 수많은 신기술과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과학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손쉬운 가공성, 낮은 생산가격, 경량성, 유연성, 분자 구조 변경의 용이성 등 플라스틱의 이 모든 장점을 갖는 전기 전도성 재료의 등장은 수많은 과학자의 연구 참여를 촉발해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밀고 나가는 원동력을 형성했다.

<그림4>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의 분자구조(폴리아세틸렌)
3인의 과학자가 합작으로 이룩한 성공
앞서 말한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1호를 만들어 내는 쾌거를 이룩한 것은 일본 동경공업대학 화학공학과의 히데키 시라카와 박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화학과의 앨런 맥디어미드(Alan G. MacDiarmid) 교수, 같은 대학 물리학과의 앨런 히거(Alan Heeger) 교수 등 3인의 과학자들의 합작품이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즉 전도성 플라스틱 발명이라는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해 뭉칠 수 있었다.
시라카와 박사는 유기화학자로서 새로운 종류의 플라스틱을 창출해 내는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도록 만들 수 있는 화학구조의 플라스틱 즉 기본이 되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맥디아미드 교수는 무기화학자로서 실리콘 등 무기화학재료의 전기적 특성을 다년간 연구하면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재료를 전기가 통하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히거 교수는 앞에서 언급한 두 박사와는 달리 물리학자로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원자나 분자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명규 기자]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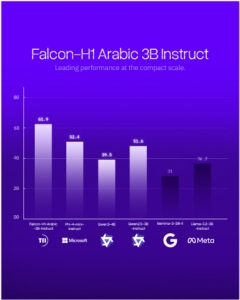



![[전문가기고] 페트병 회수기 업체들의 저가 경쟁에 신음하는 페트병 재활용 산업](https://file.yeogie.com/img.news/202406/md/b1aZhEcAwq.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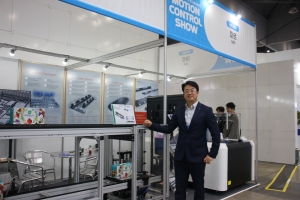


![[인터뷰] LS엠트론(주), 발포 사출로 자동차 도어모듈 생산 경쟁력 높인다](https://file.yeogie.com/img.news/202512/md/a3bSuT0jOx.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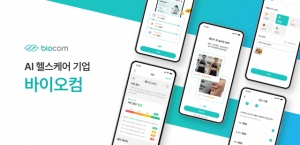
![[인터뷰] (주)아원, 친환경 윤활장치 기술로 글로벌 산업 설비 다각화](https://file.yeogie.com/img.news/202512/md/tQ74MJDSQZ.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