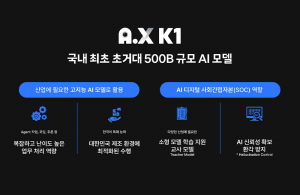Plastic Story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발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
2000년 노벨화학상 수상업적
앨런 맥디아미드, 히데키 시라카와, 앨런 히거 등 3명의 과학자는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1977년에 발명하고, 그 후 23년간 그것의 유용성을 입증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함으로써 2000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그 후 이들은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전도성 플라스틱: Conductive Polymers) 분야를 화학과 물리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도록 발전시켰으며, 이후 실용화 성공사례가 속출돼 소위 ‘플라스틱 전자시대’가 개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본지에서는 (사)한국과학문화진흥회에서 게재한 강박광 교수의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의 발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이라는 자료를 재조명해봤다.
* 자료. (사)한국과학문화진흥회

<그림1> 앨런 맥디아미드

<그림2> 히데키 시라카와

<그림3> 앨런 히거
3인의 과학자에게 수여된 노벨화학상
앨런 맥디아미드(Alan G. MacDiarmid), 히데키 시라카와(Hideki Shirakawa), 앨런 히거(Alan Heeger) 등 3명의 과학자는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1977년에 발명하고 그 후 23년간 그것의 유용성을 입증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함으로써 2,000년에 ‘전도성 고분자의 발견과 개발에의 공헌’이라는 제목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전도성 고분자’의 가장 간단한 의미로서는 ‘전도성(傳導性)(전기가 통하는 성질)이라는 말’과 ‘고분자(플라스틱을 주종으로 하는 분자량이 높은 물질)’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한 말이다. 노벨 화학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식에서 “우리는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은 플라스틱도 전기가 통하게 만들 수 있다는 혁신적인 발견을 했으며 그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중략)…… 히거, 맥디아미드, 시라카와 등 3인은 1970년대 후반에 그러한 독창적인 발견을 했으며 그 후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전도성 플라스틱:Conductive Polymers) 분야를 화학과 물리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도록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연구는 이미 실용화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축사했다.
플라스틱은 잘 알려진 재료이며 또한 전기가 통하는 재료로는 금속이 있는데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발명했다고 해 그것이 노벨상의 대상이 될 만한 큰 발명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인류문화의 발전과정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의 출현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문화 발전의 징검다리가 되는 새로운 재료의 출현
1836년 덴마크의 유명한 학자 C.J. 톰센은 인류문화 발전과정은 인류가 사용한 중요한 이기(유용한 기구)의 재료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창했다. 이는 인간이 중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있어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인류문화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 시대의 인류문화를 뛰어넘어 다음 시대의 인류문화로 건너가는데 있어 그 징검다리 역할을 새로운 재료의 출현이 담당했다는 의미이다.
약 5,000여 년 전에 인간이 구리와 주석을 섞어 청동을 만드는 청동야금술을 발명한 후로 그 이전의 신석기시대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문물들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와 찬란한 청동기 문화를 이뤘다. 또한 약 3,200여 년 전에는 철광석을 숯불이나 코크스 불로 가열해 철을 녹여내는 철야금술을 발견함으로써 최고로 정교한 금속가공기술을 만들고 수많은 철제품을 출현시켰다. 쇠의 단단하고 강함, 높은 융해온도, 풍요한 철광자원, 청동보다 저렴한 생산비용 등의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철은 청동을 몰아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류가 살아가는데 주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의 재료가 새로이 출현하면서 인류 생활의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는 폭발적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우수한 재료와 그것을 이용해 만든 부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다.

<그림4> C.J. 톰센은 인류문화 발전과정은 인류가 사용한 중요한 이기의 재료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창했다.
전도성 고분자 발명의 의미
앞서 말한 3명의 과학자의 발명으로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출현했다는 사실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우리가 주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될 것이라는 환상적인 기대 때문이다. 플라스틱과 전기를 통하는 금속재료는 이미 인간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주요하고 유용한 두 가지 재료로 군림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재료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재료 즉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의 출현은 그것을 이용한 수많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즉 ‘전도성 플라스틱’ 발명이 노벨상 수상의 대상이 된 이유도 재료가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새로운 재료라고 해도 아무 것이나 노벨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하고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고분자의 폭넓은 범위에 걸친 유용한 물성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성이 추가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갖는 재료가 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제품의 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선 간략하게만 생각해도 플라스틱은 값이 저렴하고, 원하는 모양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우수한 성형성을 가지며, 용제에 녹이면 접착제나 잉크 형태의 도포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매우 넓다. 그리고 고분자란 플라스틱은 물론 합성섬유, 비닐, 생체재료 등 매우 폭넓은 범위의 재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재료이다. 전기를 통하는 재료는 지금까지는 주로 금속성이었기 때문에 가격, 성형성, 용도의 다양성 등이 제한적이었으나 고분자가 전기를 통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가 된다.

<그림5> 고분자란 플라스틱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재료이다.
<본 내용은 월간 플라스틱기계산업 7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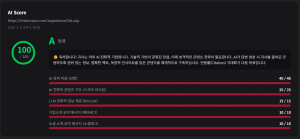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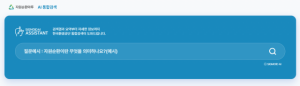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





![[전문가기고] 페트병 회수기 업체들의 저가 경쟁에 신음하는 페트병 재활용 산업](https://file.yeogie.com/img.news/202406/md/b1aZhEcAwq.png)


![[스페셜리포트] 시바우라기계, 스마트 기술력 총망라한 ‘솔루션페어 2025’ 성료](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7lXkxWJPCh.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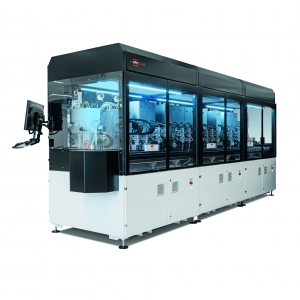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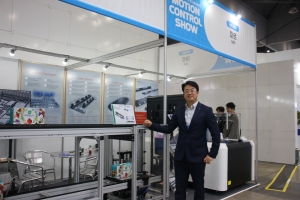


![[인터뷰] LS엠트론(주), 발포 사출로 자동차 도어모듈 생산 경쟁력 높인다](https://file.yeogie.com/img.news/202512/md/a3bSuT0jOx.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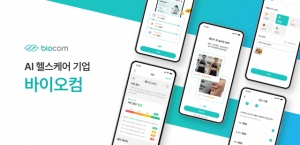
![[인터뷰] (주)아원, 친환경 윤활장치 기술로 글로벌 산업 설비 다각화](https://file.yeogie.com/img.news/202512/md/tQ74MJDSQZ.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