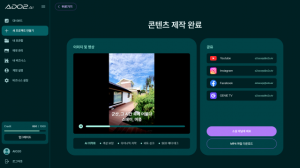2015년 일본 플라스틱 산업의 전망
1. 서론
세계 경제 정세에서 미국은 소비나 고용면에서 완만하면서도 확실한 경기 회복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유럽은 경기 회복의 움직임이 약해지고 있다. 게다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금융 완화축소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상황의 장래를 낙관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일본 경제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변동 등의 영향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 및 소득환경 개선과 각종 정책의 효과로 인해 완만한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단, 갑작스런 수요 변동의 장기화나 해외 경기의 하락이 일본의 경기를 하락하게 하는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일본은행의 경제·물가 정세 전망(2014년 10월 31일 공표)에 따르면, 일본의 경기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변동의 영향을 받아 생산면을 중심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기조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
4~6월의 성장률은 자동차 등의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갑작스런 큰 수요 반동의 영향으로 마이너스가 됐으며, 여름철에는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 개인 소비의 일시적인 하락 요인이 작용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내 수요 상승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 모두 소득에서 지출까지 진전적인 순환 메커니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본의 경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반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기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배경 전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은행이 이번에 확대한 ‘양적·질적 금융완화’가 충실히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 환경의 완화 정도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양적·질적 금융 완화에서 명목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제어되고 있는 반면, 예상 물가 상승률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실질 금리가 저하되고, 은행 대출 잔고는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 환경이 민간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를 보이면서 경기 개선에 따라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선진국의 경기 회복 상승과 더불어 그 영향이 신흥국에도 서서히 파급될 시, 성장률이 완만히 높아질 것이다. 미국 경제는 가계 지출을 기점으로 진취적인 순환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경제는 채무문제에 따른 조정 압력이 남아 있어 물가상승률의 저하, 개인 소비의 저감이나 수출의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경제 역시 대체로 안정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신흥국·자원국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 지역에 따라 불균형은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 경기 회복의 파급과 완화적인 금융 환경의 영향을 받은 내수 회복에서 성장률이 완만하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금까지 공공투자는 경제 대책의 상승효과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올해 하반기 중에는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정부에 의한 규제·제도 개혁 등의 성장 전략 추진 및 그 기초에 있는 여성이나 고령자의 노동 참가 증가, 기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응과 내외 수요의 발굴 등으로 기업이나 가계의 중장기적 성장기대와 잠재성장률은 완만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투자는 기업 수익의 개선이나 금융 완화 효과가 계속해서 상승할 때 설비 노후화에 대응하는 갱신 투자나 노동 수급의 상승세를 수용한 생력화 투자, 환율의 움직임에 근거를 둔 거점의 재구축 등 투자 이슈 증가시에 확실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광공업은 재고 조정의 진보와 완만한 증가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친 두 번째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불안은 예상되나, ①완화적인 금융 환경 및 성장 기대의 상승을 수용한 민간 수요의 견조한 증가와 ②해외 경제 성장에 의한 수출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순환 메커니즘이 유지되고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진행한 ‘ESP 포캐스트 조사’에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다음 전환점(골)이 올 예측 확률의 평균은 76%, 앞으로 1년 이내에 다음 전환점(산)이 올 예측 확률의 평균은 29%라고 공표했다.
일본의 4분기별 실질경제성장률은 2014년 7~9월부터 플러스로 바뀌어 2014년 3분기 3.66%(전월대비 4.01%), 4분기 2.26%(전년 동월대비 2.03%), 2015년 1분기 1.18%, 2분기 1.30%, 3분기 2.81%로 5분기 연속 성장이 예상되나, 소비세 증세가 시작되는 2015년 4분기에는 △3.63%로 급락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 완만한 회복이 예측되고 있다.
연도별 GDP 예측성장률 총 평균은 2014년은 실질 0.34%, 2015년은 실질 1.34%, 2016년은 실질 1.18%(고평균 1.72%, 저평균 0.71%)로 예상된다. 참고로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4년 2.10%, 2015년 3.00%, 유로권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4년 0.77%, 2015년 1.20%,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4년 7.39%, 2015년 7.20%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 경제가 위기상황을 벗어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나, 아직까지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보다 낮은 실정이다. 일본경제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적 채무가 거액이어서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으며 매크로 경제와 재정에서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유로권은 올해 초를 기준해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일시적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이 있긴 했으나, 거의 전역에서 잠재성장률이 저미(低迷)한 것을 이유로 평균적으로 감속했다는 평이다.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나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2011년과 비교해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현재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약간 낮은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며, 인도는 상대적으로 슬럼프에서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적으로 러시아에서는 불투명한 투자로 성장 전망이 한층 악화됐으며, 브라질에서도 불확실한 전망과 투자가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중이다.
여기에 손실위험(Downside Risk)요소가 가중될 가능성도 높다. 첫째,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율 추구도 일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는 금융 관련 전망에 대해 너무 낙관시하는 경향이 있다. 리스크의 경감에는 거시건전성 수단(Macroprudential Tool)이 적절하나, 이것이 곧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이 크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경제 위기의 여파는 관계국 외에는 크지 않았으며, 중동의 혼란 역시 에너지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변화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유로권의 회복이 실속(失速)해 수요가 더 약해지고, 저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변형될 여지가 있다.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세계의 연간 평균성장률은 2012년 3.5%, 2013년 3.2%, 2014년 3.4%(예측), 2015년 4,0%(예측)였다. 각국별 실질 GDP 성장률을 2013/2014/2015 3년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선진국에서는 일본: 1.5/1.6/1.1%, 미국: 1.9/1.7/3.0%, 유로권: -0.4/1.1/1.5%, 영국: 1.7/3.2/2.7%이며, 신흥시장국은 중국: 7.7/7.4/7.1%, 인도: 5.0/5.4/6.4%, 브라질: 2.5/1.3/2.0%, 러시아: 1.3/0.2/1.0%로 2015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4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플라스틱 업계에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는 아세안에 대해서는 아시아 개발은행이 GDP의 전망을 공표했다.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4 Update에 따르면, 아세안 각국의 2013/2014/2015년 성장률은 각각 인도네시아: 5.8/5.3/5.8%, 말레이시아: 4.7/5.7/5.3%, 필리핀: 7.2/6.2/6.4%, 싱가폴: 3.9/3.5/3.9%, 태국: 2.9/1.6/4.5%, 베트남: 5.4/5.5/5.7%로, 2015년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2014년을 겨우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 동안 일본 국내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량은 2010년부터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2월까지 100만 톤/월 전후로 추산되었으며, 대지진 이후에는 2013년 3분기까지는 대부분의 월이 전년도 동월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80~90만 톤/월로 변동됐다. 이후 2013년 10월부터는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1월에는 약 3년 만에 100만 톤/월에 달했으나,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반동 등으로 인해 6월에는 75만 톤/월까지 감소했다. 그 후, 회복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더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생산량은 대지진이 있던 2011년 3월에 전년 동월대비 -4.7%였으며, 이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1년 하반기 이후, 수량은 45만 톤에서 50만 톤/월으로, 전년 동월대비와 ±5%로 변화하고 있다. 2013년 후반부터 2014년 전반에 걸쳐 전년 동월대비 상승세가 계속되었으나, 5월 이후, 전년 동월대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원재료의 수입량은 2013년 후반에 걸쳐 전년 동기대비에서 감소되었지만, 2014년에 다시 전년 동기대비 증가,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상승했다. 제품의 수출입은 대부분 전년 동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일본 플라스틱 산업은 평탄한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가 기대되고, 원료 와 전력 가격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생산거점 해외 이전의 증가와 유럽, 중국 등 해외 경제 환경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장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2014년 일본 플라스틱의 산업
일본 플라스틱 산업의 원재료와 제품의 4분기 전체 생산추이를 GDP에 따라 1999년 평균치를 1.0으로 하여 <그림1>에 나타냈다.
<그림1> 플라스틱의 생산수량 추이
원재료 생산량은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주로 완만했으나, 2008년에 1분기부터 감소해 리먼쇼크 직후인 2009년 1분기에는 지수가 0.6 레벨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9년 4분기까지 급속하게 회복됐지만 0.85 전후로 나타났으며, 대지진 후 2012년까지 0.7 가까이 떨어졌다.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1분기에 걸쳐 0.8 가까이 회복했지만, 이후 0.7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제품생산량은 2002년 이후 GDP 상승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08년에 들어서며 보합세를 보였고 리먼쇼크 이후인 2009년 1분기는 0.8의 지수를 기록했다. 2010년 4분기까지는 급속한 회복을 보였지만, 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 1분기는 하락세를 나타냈고, 2012년 이후는 1.0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원재료의 경우 GDP 변동 이상의 저하로 원재료와 제품에서 GDP와의 연동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 플라스틱 원재료
<표1>에 표시한 것과 같이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의 1년간 원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1,075만 톤으로 추산됐으며, 2014년은 1,050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 매달 변화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 2011년부터 원재료 생산량의 전년 동월대비(%)와 생산량(1,000톤)을 <그림2>에 그래프로 표시했다.
<표1>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추이(단위: 1,000TON, %)
<그림2>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량과 전년 동월대비 추이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 2013년 3분기까지는 전년 동월대비가 감소된 달이 많았으나,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1분기에 걸쳐서는 전년 동월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월 생산량은 2014년 1월에 3년 만에 100톤까지 회복됐지만, 그 후 감소하여 6월에 75톤까지 떨어졌으며 7월 이후에 회복세를 나타냈다.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의 1년간 수출량은 7.6% 증가한 353만 톤으로 생산량의 33%를 차지했다. 2011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으로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2013년 4분기부터는 전년 동기를 웃돌았다.
수입량은 7.3% 증가한 263만 톤이었으며, 일본내 소비량(원재료 생산량+수입양-수출량)은 3.0% 증가한 985만 톤으로 전년 동기를 조금 넘어섰다.
2-2. 플라스틱 제품
최근 1년(2013년 4분기~2014년 3분기)간의 플라스틱 제품생산량은 전년대비(보정 후) 5.5% 감소한 1,057톤, 수출은 1.1% 증가한 80만 톤, 수입은 2.2% 증가한 197만 톤이었다. 일본내 소비량은 4.8% 감소한 1,175만 톤으로, 여전히 생산량은 플라스틱 제품 통계(종업원수 4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를 최신(2011년) 공업 통계(전사업소를 대상으로 함)로부터 산출한 커버율 55.1%로 확대 추계되고 있다.
매달 변화 수치는 <그림3>에 표시했으며, 이 표의 생산량은 플라스틱 제품통계의 원자료 그대로이다. 원재료 생산량(<그림2>)와 비교했을 때 변화폭은 좁아졌고 대지진 이후 대부분 전년과 비슷한 수준(약±5%)을 보이고 있다.
<그림3>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과 전년 동월대비 추이
주요제품분야 16과 플라스틱 제품 합계에 대해서는 2011~2014년 3분기까지의 생산동향을 1995년을 100으로 표시한 지수로 나타냈다. 참고로 1997년 이후 각 분야의 최고지수, 최저지수를 나타낸 시기를 덧붙여 표기했다. 2013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품목은 경질 필름으로 1품목, 최소치를 기록한 품목은 전기·통신 부품과 발포 제품이 있다.
<표2>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 추이(단위: 1,000TON, %)
2-3. 일본 플라스틱 수출입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3분기의 1년간 플라스틱 원재료 수출량은 7.6% 증가한 353만 톤, 폐플라스틱은 1.2% 증가한 170만 톤으로, 금액으로는 4.2% 증가한 804억 엔이었다. 또한, 원재료 수입량은 7.3% 증가한 263만 톤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원재료 무역에서는 90만 톤의 수출초과가 있었다.
한편,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은 1.1% 증가한 80만 톤, 수입은 2.2% 증가한 197만 톤으로 117만 톤의 수입초과를 보였다. 도를 넘은 엔고현상이 해소되면서 엔저로 인해 원재료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제품의 수출은 미증(微?)에 머물러있으며, 엔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2014년(1~9월)의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의 수출입 나라 별 수량과 금액 및 수량을 금액으로 나누어 단가를 함께 기록했다. 원재료 수출지로는 중국이 1위, 홍콩이 2위로, 두 개를 합친 수량은 44%(전년 동기 49%)로 전년보다 5포인트 감소했고 금액도 37%(전년 동기 40%)로 전년보다 3포인트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중국, 미국, 한국, 대만 순이었다.
원재료 수입지는 태국(수량 1위 21%, 금액 3위 15%), 미국(5위 9%, 1위 18%)으로 수량으로는 태국이 2011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소한 차이로 중국(2위 18%, 2위 15%), 한국(3위 16%, 4위 14%), 대만(4위 15%, 5위 11%)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컸으며, 중국에서 수입량이 24% 증가해 처음으로 2위를 했다. 원재료 수출입 평균 단가는 수출은 337엔/㎏으로 작년에 비해 +17엔/㎏(5% 증가) 상승했고, 수입도 248엔/㎏으로 +9엔/㎏(4% 증가) 증가했다.
제품 수출로는 중국과 홍콩으로 수량 37%, 금액 32%(전년동기 36%, 31%)로 거의 작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제품 수입으로는 중국이 수량 48%, 금액 47%(전년동기 49%, 48%)로 변함없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의 수출입 가격은 엔저현상으로 불안할 때도 있었으나, 수출 1,715엔/㎏으로 +50엔/㎏(3% 증가), 수입 482엔/㎏으로 +34엔/㎏(8% 증가) 상승했다. 제품에 관해서는 원재료와 비교해 수출과 수입간의 가격 차이가 컸으며, 3.6배의 차이는 일본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수출되고, 일상잡화 등의 범용품이 수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필자
일본플라스틱공업연맹 미즈노 야스히코(水野 靖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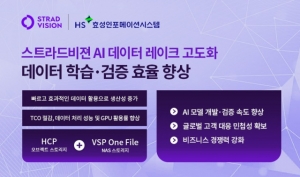



![[인터뷰] (주)마토코리아, 산업용 집진기 기술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시 실현](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m4tzpGdJWZ.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