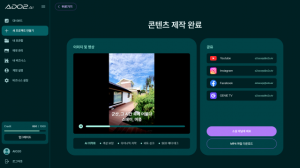<사진. 전원별 전력판매 가격(2014년도)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태양광발전은 안정성장, 바이오매스와 소수력은 약진
고정가격매입제도가 4년째를 맞이하여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는 큰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급속하게 확대된 태양광발전이 안정적인 성장을 향하고 있는 반면에, 바이오매스와 소수력발전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풍력과 지열도 이제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정부 방침으로 최초 3년간은 매입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의지를 높였다. 그 결과에 의해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전력회사가 접속을 보류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한 3년이 지나 재생가능 에너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이미 매입제도의 인정을 받은 발전설비의 규모는 원자력을 넘어 7,200만kW까지 확대되었다. 단 95% 이상은 태양광에 의한 것으로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된 전력원은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는 안정된 전력원이 되는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세 종류이다. 특히 2015년에는 바이오매스와 소수력발전의 확대가 기대된다.
2015년에는 제도면에서 큰 개정이 두 가지 예정되어 있다. 첫 번째는 발전설비의 매입가격을 확정하는 타이밍이 종래보다 늦어져 전력회사와 접속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결정된다. 특히 영향을 받는 것은 태양광발전의 매입가격이다. 2015년부터 접속을 신청한 발전설비의 가격 결정 시기는 7월 이후가 되며, 현재보다 낮은 4년째의 매입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태양광의 매입가격 중 비주택용은 2012년도 40엔(세금 제외)에서 2013년도에 36엔, 2014년도에 32엔으로 매년 4엔씩 내려가고 있다. 동일한 양상이라면 2015년도는 28엔이 되지만, 4년째인 7월부터는 26엔 전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고정가격매입제도가 시작된 후 급속하게 확대된 비주택용 태양광발전 도입량은 2015년도부터 서서히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다.
두 번째의 제도 갱신도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 수입에 영향을 준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은 상황에 따라 전력회사가 출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그 규칙은 2015년 1월 중에 갱신된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설비가 증가한 결과, 지역에 따라서는 전력 공급량이 수요를 상회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력회사가 발전설비를 선택하여 출력을 제어하는 것이 인정된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일 년 내내 출력이 안정된 수력, 지열, 원자력 등 세 종류로부터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다음에 태양광과 풍력이지만, 종래와 비교하여 출력제어의 대상이 되는 발전설비의 규모와 시간이 대폭 확대된다. 공급순서가 최후가 되는 것은 출력을 조정하기 쉬운 화력으로 바이오매스로 포함된다. 단,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목재 및 폐기물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지역형 바이오매스”는 화력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새로운 규칙으로 정해졌다. 일 년 내내 1일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태양광 및 풍력과 달리 일시적인 출력제어의 영향은 적다. 2015년도 매입가격도 종래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발전사업자에게는 전력판매 수입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대규모 설비가 되면 운전개시까지 2~3년 정도 소요된다. 지금까지는 고정가격매입제도의 인정을 받은 발전설비의 규모는 120만kW를 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규칙에서 지역형 바이오매스가 유리하기 때문에 미이용 목재 및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건설계획이 전국에서 증가할 것이다.
바이오매스와 마찬가지로 소수력발전도 2015년 확대가 예상된다. 자원에너지청이 전국의 하천을 대상으로 수력발전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대상이 되는 출력 3만kW 미만의 발전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 지점이 2,000군데 이상이다. 특히 3,000kW 미만의 소수력발전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소수력은 1군데의 발전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비 도입비용에 비해 충분한 전력판매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종래는 1kW의 전력을 만드는 데 20엔 전후의 비용이 소요되어 발전상황에 따라 판매가격을 상회할 우려도 있었다. 고정가격매입제도가 시작되고 전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이 높아져, 발전설비 비용의 저감도 추진되었다. 매입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채산성 문제는 해결된다. 소수력발전은 재생가능 에너지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고, 지역의 이해를 얻기 쉽다.
재생가능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과 지열 두 종류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출력이 1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완료까지 3~4년 소요되지만, 정부는 수속을 간소화하여 기간을 반 정도로 단축하는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다. 늦어도 2016년도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풍력과 지열개발 계획도 증가하고 있다.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







![[인터뷰] (주)마토코리아, 산업용 집진기 기술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시 실현](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m4tzpGdJWZ.jpg)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전문가기고] 페트병 회수기 업체들의 저가 경쟁에 신음하는 페트병 재활용 산업](https://file.yeogie.com/img.news/202406/md/b1aZhEcAwq.pn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