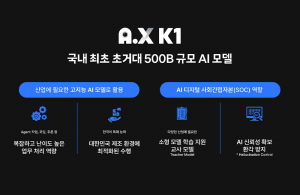*자료 : 화학소재정보은행
*필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치영 박사
<편집자 주>
신규 고분자를 설계하고 재료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고분자 작용기 간의 비공유결합, 사슬의 초분자 상호작용을 엄밀하게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새로운 고분자의 범주로 주목 받고 있는 초분자성 고분자(Supramolecular Polymer)의 최신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나노재료와의 계면 특성 제어를 통한 새로운 복합소재 개발에 기여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Ⅱ. 본론
2. 탄소나노재료와의 계면 특성 제어를 위한 이온액체 기반 초분자성 고분자
복합소재에 있어서 고분자의 측쇄 작용기는 극성(Polarity), 용해도, 호환성 등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표면에너지(Surface Energy) 특성과 Multivalent Interaction 등에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탄소나노튜브나 그래핀과 같은 탄소나노재료는 복합소재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를 고분자 매트릭스에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는 오랫동안 폭넓고 깊게 연구되어 왔다.
초창기 연구는 Clay를 고분자에 도입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다양한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사용하여 탄소나노재료를 용매에 분산하고, 순차적으로 혼합해 고분자 매트릭스에 도입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개 용매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2003년 일본 Aida 교수의 연구진은 이온액체(Ionic liquid: Imidazolium 기반 이온액체)를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
이들은 단순히 이온액체와 탄소나노튜브를 Grinding하면 나노튜브 다발이 박리되면서 Physical Gel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DSC 분석을 통해 이러한 Gel은 Mesophase가 존재하며, XRD 분석에서도 이온액체 분자들이 탄소나노튜브 표면을 따라 자기조립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초분자성 고분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이온액체의 Imidazolium Moiety는 탄소나노튜브의 표면과 Cation-π, CH- π Interaction을 하며, Alkyl Tail은 Van Der Waals 힘에 의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조립을 안정화한다. 또한 이온액체들은 결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서로 수소결합을 하여 그 구조를 보다 안정화 시킬 수 있어 탄소나노튜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된 자기조립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온액체의 표면장력은 약 35~45mN/m 수준으로, 아일랜드의 Coleman 교수가 실험적으로 증명한 바와 같이, 탄소나노재료를 분산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용매의 특성치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이온액체를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를 효과적으로 박리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Plastic Actuator의 구현하고 연성 전선으로서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됐다.
하지만 이렇게 얻어진 하이브리드 재료를 헤테로원소가 도핑된 탄소전극 재료로 사용하는 시도는 2014년에서야 이루어졌다. 이온액체는 기본적으로 헤테로 원소로 구성이 되며, 탄화효율 또한 높은 편이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그림 4)와 같이 다양한 헤테로 원소로 구성된 이온액체를 이용하여 다층 탄소나노튜브(Multiwall Carbon Nanotube)를 박리하고 Physical Gel을 만들었다. 탄화과정에서의 안정화를 위해 Tetraethoxysilane을 넣고 잘 분산 시킨 후 Formic Acid를 넣어 Silica의 Gel 형성을 유도하면, 탄소나노튜브가 잘 분산된 Monolith 형태의 하이브리드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어서 이를 적절한 온도에서 탄화하고, Silica를 녹여내면 헤테로 원소가 도핑된 다공성의 탄소층으로 코팅된 탄소나노튜브를 대량으로 손쉽게 얻어낼 수 있다.
Raman Spectroscopy를 통해 확인한 바, 탄화 과정에서 이온액체가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는 G/D 비율이 유지되는 반면, 이온액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탄소나노튜브의 Defect 형성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공유결합에 의해 탄소나노튜브 표면에서 자기조립하는 이온액체 기반 초분자성 고분자는, 높은 탄화효율 특성을 바탕으로 튜브 표면에서 다공성 탄소로 가교/탄화되면서 동시에 튜브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헤테로 원소가 도핑된 다공성 탄소층으로 코팅된 탄소나노튜브는 비금속계 촉매로는 매우 뛰어난 Oxygen Reduction 효과를 보였으며, 실제 연료전지의 성능 또한 매우 우수했다. 즉, 산소 포집 특성이 뛰어난 Graphitic Amine이나 Nitroxide 등이 잘 분포된 다공성 탄소층으로 코팅된 탄소나노튜브는 전자와의 만남이 용이하므로, Alkaline 연료전지의 Cathode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탄소나노재료와의 계면특성이 뛰어난 이온액체가 자기조립을 통해 작용기들이 가교·탄화되기 용이한 배열을 유지하며, 변형 후에 표면 위에서 촉매 반응을 위한 효과적인 반응 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림 4) 이온액체와 단층탄소나노튜브의 Grinding을 통한 나노튜브 박리와 이온액체의 자기조립에 따른 Physical Gel의 형성(위), 이온액체와 탄소나노튜브의 Physical Gel을 탄화하여 헤테로 원소가 도핑된 탄소나노튜브 복합체를 얻는 방법(아래)
탄소나노튜브와 대조적으로, 흑연(Graphite)은 넓은 접촉면적으로 그래핀들이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층간 상호작용이 월등히 강하다. 따라서 단순히 Grinding으로 많은 양의 그래핀을 효과적으로 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 일반적인 Imidazolium 기반 이온액체를 바탕으로 그래핀을 박리하는 전략은 주로 Sonication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수득율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일본 Aida 교수의 연구진은 이온액체와 그래핀 표면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안정화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5)와 같이 Imidazolium 개수를 늘린 올리고머 형태의 이온액체를 설계하고 합성하여 Multivalent interaction을 기대했다.
Spacer로 사용한 Flexible한 Ethylene Glycol Moeity는 표면장력이 이온액체와 유사하였고, 결과적으로 전체 표면장력도 탄소나노재료의 표면에 적합한 40mN/m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초음파 분산법을 적용해 흑연을 박리할 경우, 기존의 이온액체나 유기용매를 이용하는 것(수 mg/mL)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게다가 Microwave를 사용하게 되면 30분 후에 그래핀의 전체 수득률이 93%이며 이중 약 90%가 단층 그래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넓은 표면적을 지니는 단층 그래핀은 이온액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점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온액체가 그래핀 표면에서도 적절한 배열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이온액체의 화학 구조(표면 장력 포함) 및 탄소 나노구조 표면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도(위). 이온액체와 Microwave를 이용한 흑연의 박리에 대한 개념도 및 결과
3. 단일 고분자 사슬의 접힘 제어
많은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제어된 조건 하에서 접혀 있는 입체적 구조이다. 자연계에서 흔하게 기능성 구조로서 작동되는 이러한 폴리펩타이드 사슬과는 달리 합성 고분자에 있어서는 접힘 조건 제어를 통한 입체구조의 구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의 고분자 사슬을 공유결합에 의해 묶어주는 연구는 미국의 Hawker 교수가 처음 보고했으나, 정밀하게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슬 내에서 무질서하게 가교되는 것이었다.
최근에 프랑스의 Lutz 교수는 고분자 사슬을 정교하게 Cyclization하는 전략을 고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환형 고분자를 구현하였다. 이외에 여러 연구자들이 이전부터 고분자의 Cyclization을 시도했으나, 본질적으로 자연계에서 고분자 사슬이 가역적으로 접힘과 풀림을 구현하는 거동을 합성 고분자 수준에서 구현한 바는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의 Meijer 교수는 수소결합에 의해 유도되는 단일 고분자 사슬의 접힘 현상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 그룹은 단일 고분자 내에 촉매 분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작용기 도입을 시도하였고, 단일 고분자 접힘을 유도함으로써, 효소 단백질과 같은 거동을 모방했다(그림 6).

(그림 6) Meijer 그룹에 의해 보고된 단일 고분자의 접힘과 촉매 작용에 대한 개념도
하지만 최근까지도 단일 고분자 사슬의 접힘의 제어는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구조재나 윤활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되지 않았다.
최근 Meijer의 연구팀은 미국의 최근 Matyazweski 교수와 Sheiko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Polymer brush의 구조에 한쪽 말단에 접힘이 가능한 고분자 사슬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고차원적인 고분자 구조를 구현한 동시에 특정 조건에 따라 접힘 현상을 유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여전히 이 분야는 초기 단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성과는 제한적으로 얻고 있으며, 추후 여러 가지 새로운 측면에서 응용 분야의 개척이 기대된다.
4. 고분자 입체 구조의 제어 및 상호작용
고분자 사슬 측쇄의 입체적 배열은 궁극적으로 고분자의 결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기본적으로 측쇄 관능기의 위치에 따라 Atactic, Syndiotactic, Isotactic 등으로 분류를 하며, 이러한 Tacticity는 앞서 언급한대로 고분자의 결정성의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고분자 재료의 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분자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고분자 사슬간의 Van Der Waals 힘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입체적 구조를 제어하기 위해 입체 활성이 있는 촉매의 설계는 고분자 화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최근 일본 동경대학교의 Aida 교수의 연구진은 Palladium Diimide를 기반으로 하는 촉매의 반응 자리를 아조벤젠(Azobenzene)으로 엮어 환형(Cyclic)의 Brookhart Type 촉매를 보고했다. 흥미롭게도 이 촉매는 Isopropylidene Diallylmalonate의 입체 특이적 Cyclopolymerization을 유도해 측쇄에 Dialkyl Meldrum’sacid 작용기를 지니는 Threo-disyndiotactic 고분자의 합성을 유도하였다. 특이하게도 이는 유기용매에서 나노파이버(Nanofiber)로 자기조립 되어 Physical Gel을 형성했다.

(그림7)촉매의 모양에 따른 고분자 입체구조의 제어와 각각의 자기조립 거동에 대한 SEM 이미지 비교
(그림 7)과 같이 이 고분자의 측쇄 작용기의 배열은 고분자 주쇄를 잘 연신시켜 주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사슬 간 Van Der Waals 힘을 원활히 작용하여 안정화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고분자 기반 Physical Gel과 다른 자기조립 거동에 기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지상의 Polyethylene이나 Isotactic Polypropylene의 경우 유기용매에서 Physical Gel이 형성이 되지만, 각각의 고분자 사슬은 파이버 형태로 자기 조립되기 보다는, 구결정(Spherulite) 형태의 구조들이 3차원 네트워크를 이루며 Gel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Poly(Lactic Acid),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Gel을 형성하며, 이들 모두 Van Der Waals 힘에 기인해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
PMMA의 경우 Isotactic과 Syndiotactic PMMA를 동시에 섞을 경우 Fiber 구조로 자기조립 되고, 이들의 네트워크가 유기용매에서 Gel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그림 7)의 예시와 같이 단일 고분자 사슬이 Fiber로 자기 조립하여 Physical Gel을 이루는 현상이 이전에 보고된 바 없다.
대조적으로 (그림 7)(오른쪽 컬럼)의 촉매와 같이 반응 자리가 노출되어 단량체의 입체적 거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경우, Threo-diisotactic 고분자의 합성을 유도하였다. 이는 (그림 7)(왼쪽 컬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조건이나 기타 조건에서 나노파이버로의 자기조립 거동이나 Gelation 현상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Aida 교수의 연구진은 이 고분자의 측쇄 작용기인 Meldrum’s Acid가 열가교되는 현상을 통해 고분자 나노패턴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보다 다소 앞서, 미국의 Hawker 교수의 연구진은 Polystyrene이나 Polynorbornene에 기반한 고분자에 Meldrum’s Acid를 도입했는데, 이들은 입체적 특성이 제어된 상태가 아닌 무정형 고분자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측쇄 작용기인 Meldrum’s Acid가 열을 가하며, 특정 온도 이상에서 Thermolysis가 원활히 일어나고, Acetone과 CO2가 분해되어 방출되는 동시에 Ketene이 형성된다. 이들은 이어서 Dimerization을 일으켜 Cyclobutanedione 형태로 변형되어 고분자의 가교를 유도한다.
일본 Aida 교수의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을 그들의 고분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확인하였고, Hawker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그림 8)의 Threo-disyndiotactic 고분자가 열안정성과 용매 저항성이 매우 뛰어남을 확인했다. 이들은 측쇄 작용기로 Meldrum’s Acid를 지니는 다양한 고분자를 이용하여 (그림 8)과 같이 나노패턴을 만들었고, 열가교를 유도하였다.

(그림8) Meldrum’s acid가 가열을 통해 ketene을 형성하고 가교되는 과정에 대한 모식도(위), 고분자의 입체 구조에 따른 나노패턴의 열안정성 비교에 대한 SEM 이미지 비교 결과(아래)
나노파이버로 자기 조립된 고분자에 기반한 나노패턴은 240°C로 가열하거나, 유기용매에 노출해도 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다른 고분자들은 열가교에 의해 안정화 하더라도 나노패턴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는 측쇄 작용기가 서로 Van Der Waals 힘에 의해 밀접하게 작용하여 나노파이버를 이루고 다발처럼 잘 적층되면, 가교효율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도 나노구조를 유지하는 힘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고분자 측쇄의 입체 구조와 비공유결합에 의한 자기조립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Ⅲ. 결론
이상으로 신규 초분자성 고분자의 계면 특성 제어 등에 대해 일부 사례를 위주로 소개했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공유결합은 그 자체로는 매우 약하지만 고분자의 배향 등을 제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물성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 등에 기반한 고강도 유기 섬유 등에서도 널리 찾을 수 있다. 초분자성 고분자의 경우는 그 자체가 비공유 결합에 의해 고분자와 같은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기존 고분자에서 다루기 힘든 영역에서 재료 물성을 제어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자가치유 고분자들은 이러한 초분자성 고분자의 특성을 잘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공유결합에 의해 기존 고분자나 초분자성 고분자 등을 구조적으로나 물성 측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무궁무진하며, 새로운 재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계의 중요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모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





![[전문가기고] 페트병 회수기 업체들의 저가 경쟁에 신음하는 페트병 재활용 산업](https://file.yeogie.com/img.news/202406/md/b1aZhEcAwq.png)


![[전문가 기고] 조선작업용 용접로봇의 현주소와 미래 - 페어이노](https://file.yeogie.com/img.news/202506/md/zlxTrfq6o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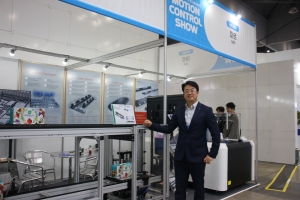


![[인터뷰] LS엠트론(주), 발포 사출로 자동차 도어모듈 생산 경쟁력 높인다](https://file.yeogie.com/img.news/202512/md/a3bSuT0jOx.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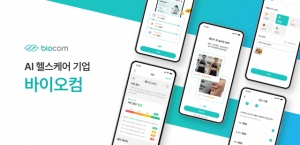
![[인터뷰] (주)아원, 친환경 윤활장치 기술로 글로벌 산업 설비 다각화](https://file.yeogie.com/img.news/202512/md/tQ74MJDSQZ.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