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중국의 플라스틱 산업
일본의 플라스틱 수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플라스틱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중국의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량과 소비량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에 대해서는 중국소료가공공업협회가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중국의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량은 5,83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소비량은 7,66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5%가 증가하였고 자급률은 76%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원재료 소비량은 일본의 원재료 소비량(2013년 960만 톤)에 비해 무려 8배의 큰 차이가 있어 중국 플라스틱 산업의 거대한 규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염화비닐의 소비량은 1,993, 1,731, 1,561만 톤으로 각각 10.2, 7.4, 10.1%의 증가율을 보였다. 3대 수지가 여전히 플라스틱 총 소비량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소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량은 6,189만 톤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수출량은 1,299만 톤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 수입량은 169만 톤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를 나타냈다. 한편, 필름 생산량은 1,089만 톤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은 3,47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발포 플라스틱 역시 전년 대비 증가 곡선을 그렸으며, 필름과 일용품의 생산도 호조를 이뤘다. 2014년 2분기까지 나타난 자료를 살펴봐도 2,055만 톤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중국의 폐플라스틱의 수입량은 위법 수입 폐기물의 단속에 의해 78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2% 대폭 감소한 바 있지만 2014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는 다시 13.5%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연간 4~5만 톤 정도이다.
함께 게재한 표에서는 중국 플라스틱 산업 통계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단, 2013년 원재료 생산량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자료를 중국소료가공공업협회로부터 입수하기 어려워 연간 자료를 게재했다.
플라스틱 제품 전체에 대한 도표는 2011년부터 대상 제품의 구분이 변경되었지만 2014년 2분기까지 중국소료가공공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다. 원재료, 폐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입량에 대해서는 Global Trade Atlas에서 발표한 중국무역통계 자료를 정리했다.


4. 맺음말 : 2015년 플라스틱 산업의 과제
일본의 경기는 엔고 수정이나 주가 상승 등 회복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본 내의 소비세 인상과 수요 반동이 장기화되고 개인 소비 회복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일본의 플라스틱업계는 엔저에 따른 원료 가격과 전력 코스트의 급등, 해외 경기의 불안 등에 의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사업 환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속되는 엔저현상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원재료의 수출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중국 등 신흥국의 생산 능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급률이 높아졌으며, 이들 신흥국이 생산하는 원재료 수지의 품질이 향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 역시 고객의 해외 시프트나 범용품의 비가격경쟁력 저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출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기획력,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플라스틱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원유 가격에 대해서는 미국 셰일오일·가스의 증산, OPEC의 안정 공급과 신흥국 경제의 감속 및 유럽의 경기 회복 지연 등에 의한 페이스 둔화를 배경으로 향후 몇 년간은 1배럴에 90달러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대 원유 생산지인 중동과 러시아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엔(円) 베이스의 수입 가격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주)마토코리아, 산업용 집진기 기술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시 실현](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m4tzpGdJWZ.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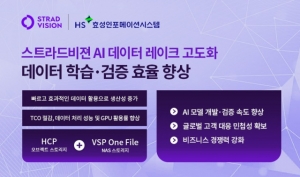




![[전문가기고] 페트병 회수기 업체들의 저가 경쟁에 신음하는 페트병 재활용 산업](https://file.yeogie.com/img.news/202406/md/b1aZhEcAwq.png)






![[KOPLAS 2023 Preview] 삼보계량시스템(주), 플라스틱 펠렛 'PLATONⅡ'로 고객 눈길 사로잡다](https://file.yeogie.com/img.news/202302/md/4QINfMIE2G.jpg)



![[인터뷰] (주)전테크, 산업폐수 처리 고효율 해법 제시](https://file.yeogie.com/img.news/202601/md/SJ74BvDszw.jpg)




